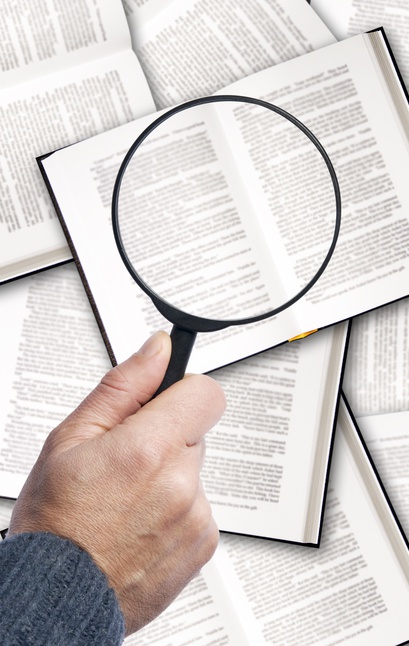서예의 역사 , 안진경 顔眞卿
다음백과
서예의 역사
서예는 한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기원은 한자의 시초인 은대(殷代) 안양기(安陽期)의 갑골문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모필에 의한 서사체의 예술성 추구는 후한대(後漢代)부터 본격화되었으며, 남북조시대 동진(東晉)의 왕희지(王羲之) 등에 의해 서풍의 전형이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때에 한자가 전래되었으나 서예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한사군(漢四郡)을 통해 한대의 문화가 유입되면서부터이다(→ 한국의 미술). 삼국시대의 서예는 금석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고구려는 위예법(魏隸法)에 동진의 해법을 가미한 예해혼합풍(隸楷混合風)이 성행했던 듯하며, 특히 광개토대왕비(414)의 서체는 질박하고 근엄한 특색과 함께 웅장한 기상이 담겨 있어 당시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 명품으로 꼽힌다.
백제의 서예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매지권(買地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왕희지체를 연상시키는 유려하고 우아한 필치의 남조풍(南朝風)이 근간을 이루었으며, 말기에는 방정하고 힘이 있는 북조풍이 가미되기도 했다. 신라의 서예는 고구려와 같이 북조풍에 토대를 두고 전개되었으며, 진흥왕 때 세워진 순수비의 서체는 단중하며 북비(北碑)의 일등 서품과 비교될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보다 다양하고 활기찬 발전을 보였는데, 특히 신라의 왕희지로까지 지칭되었던 김생(金生)은 왕희지체와 안진경체(顔眞卿體) 등을 융합하여 개성이 뚜렷한 새로운 서풍을 창안했다.
이러한 김생체는 고려 후기 때 이규보(李奎報)에 의해 '신품제일'(神品第一)로 평가되기도 했다. 8세기경까지는 왕희지체가 주류를 이루면서 김생체가 완성되었던 데 비해 9세기 무렵부터는 구양순체(歐陽詢體)가 쓰이기 시작하여 고려 초기로 계승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서예는 문사들의 교양적 기능의 하나로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사를 전업으로 하는 서학박사(書學博士)를 비롯한 전문직 이원(吏員)의 양성 등으로 크게 발전했다.
고려 초기에는 앞 시기의 서풍을 계승하여 자획과 결구가 모두 방정하고 굳건한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특히 비문 글씨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후 11세기 전반경에는 우세남체(虞世南體)를 가미하면서 점차 우미수려한 필체로 변모되다가 중기에 이르러 문운의 극성기를 맞으면서 문화적 난만성을 반영하는 왕희지체가 대감국사(大鑑國師) 탄연(坦然)을 중심으로 성행했다.
고려시대 최고의 서가로 손꼽혔던 탄연은 왕희지체에 토대를 두고 안진경체와 사경풍(寫經風)의 필법을 가미하여 전아유려하면서도 힘이 있는 새로운 서풍을 창출하고 당대는 물론 무신집권시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고려 후기에는 서예가 일반회화와 함께 지식층의 심성양성과 교양적 기능의 하나로 널리 인식되면서 보다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규보는 서예를 천지음양의 배합이라는 우주적 윤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등 회화의 창작이론과 같다고 인식했으며, 〈동국제현서결평론서 東國諸賢書訣評論書〉를 통해 우리나라 명필들을 신(神)·묘(妙)·절(絶)의 3품으로 나누어 평하고 그 가치를 논함으로써 서예이론과 서예비평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다.
이 시기의 서풍은 최선(崔詵)의 〈용수각개창기 龍壽閣開創記〉와 김효인(金孝印)의 보경사원진국사비(寶鏡寺圓眞國師碑) 등을 통해 볼 때 앞 시기 탄연체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차 안진경체의 장중한 분위기가 살아나는 경향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말기에 서예는 원종대부터 한문학을 비롯한 시서화의 전반적인 성장에 수반되어 더욱 확산·심화되었으며, 서풍도 원과의 밀접한 문화교류를 통해 조맹부(趙孟頫)의 송설체(松雪體)가 유행했다.
서예에서 진(晉)·당으로의 복고를 주장했던 조맹부의 송설체는 자유롭고 분방한 송대 서풍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바르고 아름다운 독특한 서체로서 연경(燕京)의 만권당(萬卷堂)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당시 고려·원과의 서화교섭을 따라 국내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송설체는 이 시기를 통해 전개되어 이제현(李齊賢)·이암(李嵓)·공민왕 등의 명가를 배출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암의 명성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그를 중심으로 송설체가 정착되어 조선 초기로 계승되었다.
조선 초기의 서예는 고려 말기에 수용한 송설체가 일종의 국서체로서 크게 풍미했으며, 안평대군 이용(李瑢)에 의해 주도되었다.
시문서화에 모두 능했던 그는 송설체를 조맹부보다 더 수려하고 청경하게 다루어 명나라에서도 그를 당대 제일의 서가로 손꼽았다. 균제미 넘치는 그의 이러한 서체는 강희안(姜希顔)·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서거정(徐居正)·성임(成任) 등의 추종자를 통해 크게 풍미했다. 그리고 그가 실각한 이후에도 계승되어 16세기 전반경에는 성수침(成守琛)과 이황(李滉) 등에 의해 건중한 맛이 가미되기도 했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서예는 사자관(寫字官) 출신인 한호(韓濩)에 의해 새로운 변화를 보였다. 선조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고 임진왜란 중에 외교문서를 도맡아 써서 중국인들에게까지 절찬을 받았던 그는 왕희지체에 조선화된 송설체를 가미하여 단정하고 정려한 석봉체(石峰體)를 이룩하고 당대의 서예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호가 왕명을 받들어 쓴 해서 천자문이 1587년 판각되어 전국에 반포됨으로써 글씨 학습의 교과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는 주자(朱子) 이전의 원시유학을 지향했던 허목(許穆)이 서법 또한 복고를 신념으로 하여 고문전(古文篆)이란 새로운 서체를 창안했는데, 이것은 후대의 남인계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에는 이숙(李淑)에 의해 왕희지의 진체(晉體)에 미불(米芾)의 필의를 가미한 이른바 동국진체(東國眞體)가 출현하여 이 서체가 윤두서(尹斗緖)와 윤순(尹淳)을 거쳐 이광사(李匡師)에 이르러 집대성되었다.
특히 이광사는 윤순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용된 명대의 문징명체(文徵明體)를 가미하여 자기풍의 원교체(員嶠體)를 이룩하는 한편 진한 이래의 고비(古碑)를 새롭게 인식하고 예법(隸法)을 익혀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서론(書論)에 있어서도 역리(易理)에 바탕을 두고 개진된 이서의 〈필결 筆訣〉을 본받아 보다 더 방대한 체제를 갖춘 〈원교서결 員嶠書訣〉 전후 양편을 저술하여 동국진체의 이론적 체계를 정리했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서예는 18세기 말기의 박제가(朴齊家)·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 등의 북학파 실학자들을 통해 소개된 청대 고증학파의 신서학 경향이 김정희(金正喜)에 의해 추사체(秋史體)로 완성되어 크게 유행했다.
김정희는 서법의 근원을 전한예(前漢隸)에 두고 이 서체를 해서와 행서 등에 응용하여 청나라의 비학파(碑學派)들도 염원하던 이상적인 새로운 양식을 창안했다. 조형성과 예술성에서 뛰어났던 그의 이러한 추사체는 신헌(申櫶)·이하응(李昰應)·서상우(徐相雨)·조희룡(趙熙龍)·이상적(李尙迪)·허유(許維)·전기(田琦)·오경석(吳慶錫) 등의 추사파 서화가들을 통해 일세를 풍미했다.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시서화 교양문화가 잔존했으며 김윤식(金允植)·김가진(金嘉鎭)·윤용구(尹用求)·박영효(朴永孝)·이완용(李完用) 등의 문인서가들이 활동했다.
이 시기를 통해 김규진(金圭鎭)·오세창(吳世昌)·정대유(丁大有)·현채(玄采)·김돈희(金敦熙) 등 직접적인 서예가가 출현하여 전문적인 서예계가 형성되었고, 주로 서화협회전(약칭 협전)과 조선미술전람회(약칭 선전)의 서부(書部)를 통해 작품활동을 했다. 근대적인 전문서예계의 형성은 8·15해방 이후 보다 활성화·다양화되면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의 서예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백과
안진경
다른 표기 언어 Yen Chench'ing. , 顔眞卿
| 출생 | 709, 경조(京兆) 만년(萬年:지금의 산시 성[陝西省] 시안[西安]) |
|---|---|
| 사망 | 785 |
| 국적 | 중국, 당(唐) |
요약 안사의 난과 이희열의 난 때 큰 공을 세웠으나 난 중에 순국했다. 공훈과 예술적인 재능으로 인해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집안이 가난하여 종이와 붓이 없었으므로 담벽에다 황토로 연습하여 서예를 익혔으며, 해서에 뛰어났다. 벼슬길에 나간 후에는 장욱에게 배워 서예에 더욱 진전이 있었다. 그의 해서는 장엄하고도 웅장하며 기세가 툭 트여서 마치 단정한 선비를 보는 것 같다. 평론가들은 <중흥송마애>, <원차산비>, <송광평비>, <안씨가묘비> 등과 같은 만년의 작품을 높이 친다. <제백부고>, <쟁좌위>, <채명원> 등의 첩에 나타난 그의 서체는 힘차면서도 급작스럽게 꺽이는 등 변화무쌍하며 전서체와 주문을 겸비했다. 후대의 유공권, 양응식, 미불, 채경, 조병문, 전풍, 하소기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자는 청신. 안사의 난과 이희열의 난 때 큰 공을 세웠으나 난중에 순국했다. 공훈과 예술적인 재능으로 인해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남북조시대 이래로 그의 선조 가운데 안등지·안지추·안사고·안근례 등이 모두 고문자학을 연구했고 서예에도 뛰어났었다. 인척관계에 있던 은영명·은중용 부자도 또한 당대 초기의 유명한 서예가였다.
안진경은 "집안이 가난하여 종이와 붓이 없었으므로 담벽에다 황토로 연습하여 서예를 익혔으며, 해서에 특히 뛰어났다"고 한다. 벼슬길에 나간 후에는 장욱에게 배워 서예에 더욱 진전이 있었다. 그후 남북을 두루 다니며 관리생활을 하면서 유명한 석각을 많이 보았다. 예컨대 한대(漢代)의 여러 비(碑), 타이산 산[泰山]에 있는 북제 때의 〈금강경 金剛經〉 , 남량 때의 〈예학명 瘞鶴銘〉 등을 두루 보면서 시야가 넓어져 필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안진경은 해서·행서·초서에 모두 능했다. 그의 해서는 장엄하고도 웅장하며 기세가 툭 트여서 마치 단정한 선비를 보는 것 같다.
평론가들은 〈중흥송마애 中興頌磨崖〉·〈원차산비 元次山碑〉·〈송광평비 宋廣平碑〉·〈안씨가묘비 顔氏家廟碑〉 등과 같은 만년의 작품을 높이 친다. 〈제질문고 祭侄文稿〉의 필적, 〈제백부고 祭佰父稿〉·〈쟁좌위 爭座位〉·〈채명원 蔡明遠〉·〈송류태충서 送劉太沖敍〉 등의 첩에 나타난 그의 서체는 힘차면서도 급작스럽게 꺾이는 등 변화무쌍하며 전서체와 주문을 겸비했다. 또한 스스로 독자적인 일파를 이루어 한 획도 2왕(二王 : 왕희지·왕헌지 부자)의 필체와 비슷한 것이 없었다.
소동파는 안진경의 서예와 두보(杜甫)의 시, 그리고 오도현의 그림을 최고의 모범이 된다고 평했다. 안진경의 서예는 후대의 유공권·양응식·소식·황정견·미불(米芾)·채경·조병문·동기창(董其昌)·왕탁·유용·전풍·하소기 등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안진 경의 가문에서 만들어놓은 '안씨자양'은 당대부터 청대(淸代)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 동안 과거시험장에서 '정체'의 글씨로 쓰였다. 명 만력연간에 이르러서는 간행된 서책의 글자체가 모두 안진경체로 되었는데, 이른바 '노송체자'로서 수백 년 동안 성행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