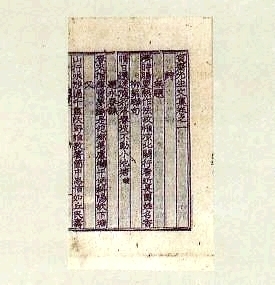신개
| 조선 |
| 1374년(공민왕 23) |
| 1446년(세종 28) |
| 좌정언, 호조좌랑, 사간원헌납, 우사간대부, 예조참의, 공조판서, 중군도총제, 대사헌, 우참찬, 우의정, 좌의정 |
| 인물 |
| 문신 |
| 인재문집 |
| 남 |
| 역사/조선시대사 |
| 평산(平山) |
요약 조선전기 우참찬,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자격(子格), 호는 인재(寅齋)·양졸당(養拙堂). 할아버지는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 신집(申諿)이고, 아버지는 종부시령(宗簿寺令) 신안(申晏)이다. 어머니는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임세정(任世正)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390년(공양왕 2) 사마시에 합격하고 1393년(태조 2)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로 발탁되었는데, 당시 태조가 실록을 보자고 할 때 그 불가함을 강력히 논하였다. 이어 감찰·문하습유(門下拾遺)·좌정언(左正言)·형조좌랑·호조좌랑을 거쳐 충청도도사로 나갔다가 다시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이조정랑·사인(舍人)·예문관제학·판승문원사(判承文院使) 등을 역임하였다. 1413년(태종 13)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로 발탁되는 동시에 춘추관편수관·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
간관(諫官)으로 있으면서 주장한 의정부서사제도(議政府署事制度)의 폐지는 다음 해에 실현되었다. 그 뒤 예조참의·병조참의·충청도관찰사·한성부윤을 역임하고 1417년에 공조참판에 올랐고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세종 즉위 후 전라도·경상도·황해도의 도관찰사를 역임하고 형조참판·진주목사·우군총제·좌군총제·예문관대제학·전라도관찰사·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1433년(세종 15)에는 야인이 자주 변경을 침입, 큰 피해를 입히자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야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 해 이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이조판서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형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올라 지춘추관사를 겸임하면서 『고려사(高麗史)』 편찬에 참여하였다. 1436년에 찬성으로 승진하여 세자이사(世子貳師)·집현전대제학을 겸임하였다.
1439년에 우의정에 올랐으며, 1442년에는 감춘추관사로 권제(權踶) 등과 더불어 편찬한 『고려사(高麗史)』를 올렸다. 1444년에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다. 재상으로 있으면서 공법(貢法)·축성(築城) 등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불편한 것은 이를 건의, 시정하도록 하였다. 세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저서로 『인재문집(寅齋文集)』이 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 『태조실록(太祖實錄)』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사가집(四佳集)』
- ・ 『인재집(寅齋集)』
-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 『해동잡록(海東雜錄)』
-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 『국조방목(國朝榜目)』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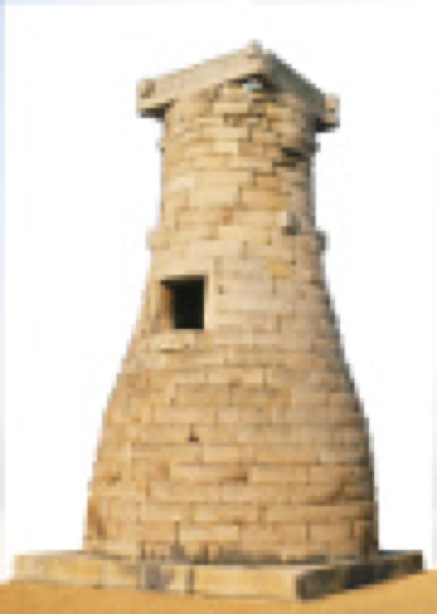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 창고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한국학 지식 백과사전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주 괘릉 석상 및 석주 일괄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괘릉의 석인상 · 석사자상 · 석주 등의 능묘조각상. 경주괘릉. 조각 유적 문화재
encykorea.aks.ac.kr
신개 (申槩) (문희공파시조)文僖公派 (15세)
좌의정(정1 품) [1374∼1446] (73세) (공민왕 23∼세종 28)
조선 초기의 문신, 자는 자격(字格), 호는 인재(寅齎), 고려조에서 전리판서(典理判事)와 수문전 대제학(修文殿大提學)을 지내신 신집(申輯)의 손자, 대제학 집의 셋째 아들인 안(晏)은 고려 말에 봉선고 판관(奉先庫判官)을 거쳐 종부시령(宗簿寺令)에 이르렀으나 고려가 망하자 평산의 황의산에 들어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켰다. 1417년(태종17)에 죽으니 시인(時人)들이 그의 절의(節義)를 높여 그가 살았던 곳을 배록동(排祿洞)이라 하였으며 후에 좌의정(左議政)에 추증되신 신안(申晏)이 아버지이시며, 어머니는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임세정(任世正)의 딸이다.
1374년(고려 공민왕 23) 송도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나면서부터 기질이 청수(淸粹)하고 용모가 단의(端毅)하였고 외가 원씨의 양육을 받고 자랐는데 거지(擧止)가 비범하고 성인(成人)과 같았다. 1390년(공양왕 2) 17세에 생·진 양시(生·進 兩試)의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393년(태조 2)20세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로 발탁되었는데, 당시 태조가 실록을 보자고 할 때 그 불가함을 강력히 논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 후에도 자주실록 열람을 원하는 임금들에게 간(諫)하는 신하들의 좋은 구실이 되었다.
익년 태조가 한양에 천도하는데 따라 한성 정릉동으로 이거했다. 1395년 한림(翰林)을 선수(選授), 1400년(정종 2) 사헌부감찰 이어 감찰·문하습유(門下拾遺)·좌정언·형조좌랑·호조좌랑을 거쳐 충청도도사 나갔다가 다시 헌납·이조정랑·사인(舍人)·예문관제학·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등을 역임하고, 1413년(태종 13)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로 발탁되는 동시에 춘추관편수관·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다.
간관(諫官)으로 있으면서 주장한 의정부서사제도(議政府署事制度)의 폐지는 다음해에 실현되었다. 이 때 그는 40세였는데 정부 각대신(政府 各大臣)의 비리 등을 기탄없이 거론하여 태종이 「수유불지사체, 망언대신천권(竪儒不識事體, 妄言大臣擅權)」이라고까지 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논변을 꺽지 않았다.
그 뒤 414년 예조참의·병조참의·충청도관찰사·한성부윤을 역임하고 1417년에 공조참판을 거쳐 공조판서에 올랐으며, 이 해에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세종 즉위 후 전라도·경상도·황해도의 도관찰사(都觀察使)를 역임하고 형조참판(刑曹參判)·진주목사·우군총제·좌군총제·예문관대제학·전라도관찰사·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1430년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1433년(세종 15)에는 야인이 자주 변경을 침입하여 큰 피해를 입히자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야인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 해에 이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이조판서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형조판서를 거쳐 우참찬(右參贊)에 올라 지춘추관사를 겸임하면서 《고려사》 편찬에 참여하였고, 1436년에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후 세자이사(世子貳師)·집현전대제학을 겸임하였다.
기미년(1439, 세종 21)에 우의정에 임명되매 전문(箋文)을 올려 사퇴(謝退)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곧 태종(太宗)의 유교(遺敎)이다.’ 하였다. 1442년에는 감춘추관사로 권제 등과 더불어 편찬한 《고려사》를 완성하였고, 재상으로 있으면서 공법(貢法)·축성(築城) 등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불편한 것은 이를 건의하여 시정하도록 하였다.
갑자년(1444, 세종 26)에 궤장을 하사받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을축년(1445, 세종 27에 좌의정에 승진되었다가 이때(1446, 세종 28)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 73세이었다.
임금이 매우 슬퍼하여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조문(弔問)과 부의(賻儀)를 의식대로 하고 관(官)에서 장사를 치렀다. 문희(文僖)란 시호(諡號)를 내리니, 학문에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조심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희(僖)라 하였다. 세종의 묘정(廟廷)에 배향(配享)되었으며, 묘소는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광평리에 있고, 저서로 《인재문집》이 있다.
공(公)은 자준(自準 : 관찰사를 역임), 자승(自繩 : 대사성을 역임), 자형(自衡 : 집의를 역임) 세 아들을 불러놓고 대대로 물려내릴 가훈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가르쳤다. <언충신, 행독경, 소심익익, 대월상제(言忠信, 行篤敬, 小心翼翼, 對越上帝)>의 유훈을 받은 3형제는 모두 벼슬길에 나가 관직을 지내며 후대에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시켜 평산 신씨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다.
저서로 《인재문집》이 있다.
인재문집은 후손 우균(佑均)이 편집한 것을 1929년 경상북도 문경(聞慶)의 상강정(上江亭)에서 간행하였다. 책머리에 유묵 1편이 있고, 책끝에 후손 현국(鉉國)의 발문이 있다. 책의 내용은 권 1은 시 8수, 기(記) 2편, 소(疏) 9편, 권 2 는 소 9편, 전(箋) 1편, 권 3 은 계(啓) 12편, 문(文) 1편, 잡저, 권 4 는 부록으로 연보·정원일기(政院日記)·사제문·사전(史傳)·신도비명(神道碑銘)·자손록·묘표·서양졸당기후(書養拙堂記後) 각 1편 등으로 되어 있다.
부록은 저자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담은 것인데 서거정(徐居正)이 신도비명을, 신호(申護)가 묘표를 썼다. 4권 2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국민대학교도서관·충남대학교도서관 소장되어 있다.
원래 그분의 시문이 전쟁 등으로 소실되어 전하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그의 사후 480여년이 되는 1929년 후손 현국(鉉國)이 소, 계 , 전 (疏, 啓 , 箋)등은 정원(政院)의 기록에서 수집하고 시, 서, 기(詩, 序, 記) 등은《동문선(東文選)》 등에서 뽑고,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던 연보 ·비갈(碑碣) 등을 부록하여 출간하였다. 시는 직선적이고 백담(白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뿐만 아니라 <육송정기(六松亭記)>는 1427년(세종 9) 강음현(江陰縣)에 유배되었을 때 근처의 육송정이라는 정자를 소재로 소나무의 정절을 스스로 대비하면서 전부(田夫) 등에 섞여 사는 정경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분은 문학 뿐만 아니라 정치현실에 대하여도 나라를 위하는 강직함이 나타내는 문서가 많은데, <청사평양민원옥소(請赦平壤民寃獄疏)>는 무고하게 옥사당한 평양 백성 10여 명을 애도하고 이에 책임이 있는 형조판서부터 우의정에 이르는 14명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행서사소(請行署謝疏)>는 재소(再疏)까지 2,300자에 달하는 장문인데, 고관들의 손명훼절(損名毁節)을 막기 위해 5품 이하에만 시행하던 서사법(署謝法)을 2품 이상에까지 실시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외 <청미도소(請 盜疏)>는 도적 방지책을 건의한 것으로 한국형법 연구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는 또한 세종대 북방경략에 관여한 사람으로 <청토야인소(請討野人疏)>(2,500자) <청함평양도설관소(請咸平兩道設關疏)>(1,300자) 등에서 세종대 북방 방비책의 방향을 결정한 중요한 건의를 피력하고 있다.
서울대 규장각 분류번호 15755 의 인재문집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인재선생문집(규15755), 신개(조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