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진의 차맥] (10) 일본다도의 신화학과 탈신화학 (3) 日다도는 차노유와 와비 이중적으로 즐겨
2014. 10. 29. 00:17ㆍ차 이야기
[박정진의 차맥] (10) 일본다도의 신화학과 탈신화학
(3) 日다도는 차노유와 와비 이중적으로 즐겨
차문화사(칼럼/연재) 2014/07/14 13:37 돌방[박정진의 차맥] (10) 일본다도의 신화학과 탈신화학 (3) 日다도는 차노유와 와비 이중적으로 즐겨
“센리큐 임란 반대는 평화수호 아닌 비즈니스 목적 때문”
한국 차인들 무조건 추종은 무사도와 신도 숭배하는 꼴
일본 교토(京都)는 일본 차의 메카이다. 일본 차(茶)와 선종(禪宗)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교토의 서북쪽에 있는 도가노산(梅尾山) 들머리에는 ‘일본 최고의 다원’(日本最古之茶園)이라는 표지석이 있다. 가마쿠라(鎌倉) 시대인 1206년 묘에상인(明惠上人)이 에이사이(榮西·1141∼1215) 선사에게 받은 차 씨앗을 이곳에 뿌린 것을 말한다. 그 차가 일본 우지(宇治)로 건너가 말차의 원조가 되었다. 에이사이 선사는 일본 가마쿠라 시대에 중국 천태산 만년사에서 수행한 뒤 차 씨를 가지고 돌아와 세부리산(背振山) 소후쿠지(聖福寺)에 심었다. 그때가 전구 2년(1191년)이다. 그리고 묘에상인은 에이사이 선사로부터 받은 차 씨(차나무였다는 설도 있음)를 고잔시(高山寺)에 심었다. 우지의 오바쿠산(黃檗山) 만후쿠지(萬福寺) 산문에 이르면 높이 1.5m, 폭 1m 정도의 비석 한 개가 서 있다. 묘에는 우지의 고노에 집안에 차 씨를 보내어 말을 타고 발자국에 심게 하였는데 이것을 기념하여 만후쿠지의 문 앞에 비석을 세웠다.
 |
| 일본 다도 최대 유파인 우라센케의 15대 종장이었던 센겐시쓰가 다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오늘의 일본 다도가 정립된 시기는 15세기 전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본 다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 문화통인 이원홍 전 문화공보부 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일본 다도의 미의식은 유현(幽玄)과 고담(枯淡)으로 상징된다. 차노유(茶の湯)는 서원형(書院型)의 주택에 전중차(殿中茶)가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게노차(地下の茶)와 선(禪)이 융합하여 무라다주코(村田珠光)의 ‘와비차(侘び茶)’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케노보(池坊尊慶)에 의해 입화(立花)가 규격화되고, 향도(香道)가 발생했다.”
그는 또 “일본 다도는 15세기 중엽 이전의 차를 ‘다도’라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그 이전에는 당시 차를 먹기는 했지만 소위 차노유(茶の湯)라는 말이나 다도(茶道)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세기 초에 이미 일본 다도를 미국에 소개한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1862∼1913)은 ‘차의 책’(茶の本·1906년뉴욕에서 영문으로 간행)에서 다도를 ‘예술지상주의라는 종교’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이 말은 다도를 예술의 경지에까지 올린 자신감에서 솟아난 말이다. 다도는 일본 정신의 즉물적 완성이다.
일본 다도의 양면성인 ‘차노유’와 ‘와비’는 연속되면서도 동시에 단속과 차이를 보인다. 오늘의 일본 다인들은 검소한 차 생활을 말할 때는 ‘와비’를 내놓으면서도 은근히 ‘차노유’ 시절의 화려함과 다기에 대한 숭배를 드러내기도 한다. 검소함만으로는 문화의 번창과 화려를 인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차노유는 흔히 ‘차노유정도’(茶の湯御政道)라고 하는데 이는 권력화된 차의 모습을 단적으로 말한다.
최근 일본 무샤노코지센케 이에모토 14대 센소슈(千宗守)는 “센리큐가 임란을 반대한 것은 평화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상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면 무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차의 세계’ 인터뷰에서 발설해 화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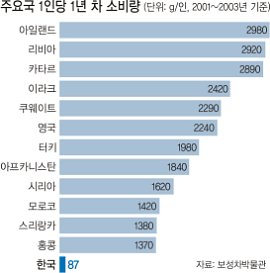 “리큐의 뜻은 평화적인 것보다는 당시 비즈니스 감각에서 이에야스가 출병을 반대하니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순한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그 뒤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는 뜻밖의 발언이었다. 일본 다도의 신화를 한꺼풀 벗기는 일성(一聲)이었다.
“리큐의 뜻은 평화적인 것보다는 당시 비즈니스 감각에서 이에야스가 출병을 반대하니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순한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그 뒤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는 뜻밖의 발언이었다. 일본 다도의 신화를 한꺼풀 벗기는 일성(一聲)이었다. 한국 차인들이 일본 다도를 모방하는 것은 한복을 입지 않고 기모노를 입는 것과 같다. 행다의 동작들은 그 나라의 의상 및 식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행다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선비문화와 무사문화의 차이에 기인한다.
무사문화는 정신집중을 하더라도 항상 남과 밖을 경계한다. 선비문화는 자신과 안을 바라보면서 남에게는 마음을 열어놓는다. 무사들은 언제나 적에게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다. 남의 시선을 항상 의식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선비들은 남을 끌어안으려고 한다. 일본은 심(心)을 물(物)에 바치고, 한국은 물(物)을 심(心)에 바친다. 일견 같아보이지만 도리어 정반대이다. 밖으로 열려진 ‘심정(心情)의 다도’와 밖을 경계하는 ‘경계(警戒)의 다도’는 다르다.
일본 다도 종가 센리큐가에는 3대 유파가 있다. 오모테센케(表千家), 우라센케(裏千家), 무샤노코지센케(武者小路千家)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장자격인 오모테센케는 일본 다도를 주도해왔다. 오모테센케는 후신안(不審庵)을 중심으로 현재 14대, 우라센케는 곤니치안(今日庵)을 중심으로 15대, 무샤노코지센케는 간큐안(官休庵) 차실을 중심으로 14대에 이르고 있다. 이들 다도 종가의 역사는 줄잡아 500여년, 다도인구는 100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일본 다도 최대 유파인 우라센케의 15대 종장이었던 센겐시쓰(센리큐의 15대 직계손)는 다도를 통한 세계평화에 관심을 갖고 전 세계에 다니며 다도를 보급하는 한편 전몰자를 추모하는 헌다식(獻茶式)을 거행하는 등으로 일본 다도를 세계적인 것으로 격상시켰다.
그는 1984년 12월 로마에서 교황을 알현한 뒤 바티칸 대성당에서 헌다식을 거행했다. 당시 그는 당당한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는 또한 1998년 10월 경주세계엑스포 당시 불국사 헌다식에 이어, 2002년 4월 김해시초청으로 은하사 헌다식을 거행한 바 있다. 부처님께 올리는 헌다는 역대 이에모토만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
| 일본 교토 도가노산(梅尾山) 들머리에 있는 일본 최고(最古) 다원(茶園)을 표시하는 비석. |
확실히 오늘날 세계 다도의 견인 역할을 일본의 다도가 맡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일본 다도가 오랜 전통과 탄탄한 짜임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다도를 키워나가야 한다. 분명히 일본과는 다른 차(茶)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센겐시쓰는 차 전문지 ‘차의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센리큐의 대립이 없었다면 일본 다도는 크게 발전하였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도요토미와 나의 조상 센리큐의 대립은 불행한 일이지요.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력을 쓰려고 할 때 센리큐는 무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격분한 도요토미는 센리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자살을 명령해서 센리큐는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그 뒤에 도요토미는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도요토미가 리큐를 할복시킨 것에 대해 후회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만약에 도요토미가 그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날 일본 다도는 놀랍게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리큐가 전쟁에 반대한 이유는 조선 문화의 혜택을 입은 일본으로서 조선의 문화를 파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다도에는 신도와 무사도의 전통이 숨어 있다. 만약 우리가 다도를 추종하면 결국 무사도나 신도를 숭배하는 꼴이 된다. 일본 다도가 나름대로 잘 정리된 동양문화의 정수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수용하기 쉽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국인에게 어울리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화평론가 pjjdisco@naver.com
 ■ 茶 포토에세이
■ 茶 포토에세이 ‘문 없는 문’(無門)에서 맛본 선미(禪味)
신라 문무왕 16년(676)에 의상 대사는 화엄일승법계도에 근거하여 부석사 무량수전을 개창한다. 그 부석사 무량수전을 빼닮은 정토사 무량수전이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2리에 자리 잡고 있다. 무량수전의 ‘문 없는 문’(無門)에서 향긋한 차 맛에 빠졌다.
무문혜개 선사가 말씀한 ‘문 없는 문의 진리’가 이 무량수전에 확연히 드러난다.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차 한 잔의 시간이 아닐는지. 당나라 시인 노동이 ‘칠완다가’에서 읊은 “일곱 번째 잔의 차 한 모금의 맛이야말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해 준다”는 그 의미가 와 닿는다.
차 한 잔을 나누는 두 스님의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자니 또한 다선일미 속에 빠져든다. 빗줄기가 거센 가운데 들리는 찻물 떨어지는 소리, 차향은 더욱 은은하게 풍겨난다. 무량수전의 그 아름다움 속에 차 한 잔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랴. 이 아름다운 사찰을 완성해 낸 건축가 김개천씨는 “비어 있는 우주적 질서의 유위인 동시에 무위로써 유위도 극복하고 무위조차 초월하고자 하는 한국의 미, 선의 미를 건축에 담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토사 무량수전은 창이 닫히면 빛으로 이루어진 절대 무의 건축이며, 창이 열리면 건물이 사라지는 절대 무의 건축으로서 유와 무가 공존하는 공간, 즉 차 한 잔이 우주를 토해내는 것과 같이 극락정토로 향하려는 염원이 이 건축에 담겨 있는 듯하다.
글·사진=사진작가 운암(雲巖)
- 자료출처 : 세계일보 -
- 블로그 <오마이뉴스 돌방다방 > 돌방 님의 글 중에서 ....
'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정진의 차맥] 〈22〉 한국차 신화학 다시쓰기 - ⑩ 화랑의 차, 국제화 (0) | 2014.10.29 |
|---|---|
| [박정진의 차맥] 〈21〉 한국차 신화학 다시쓰기 - ⑨ 화랑의 차, 한국 차 문화의 원형 (0) | 2014.10.29 |
| [박정진의 차맥] (11) 일본다도의 신화학과 탈신화학 (4) 와비차는 ‘박제된 매월당의 초암차’ (0) | 2014.10.29 |
| [박정진의 차맥] (13) 한국차의 신화학 다시쓰기 ① 매월당은 한국차 부활의 블랙박스 (0) | 2014.10.28 |
| 화랑들이 머문 다도 정신의 발자취를 찾아서 (0) | 2014.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