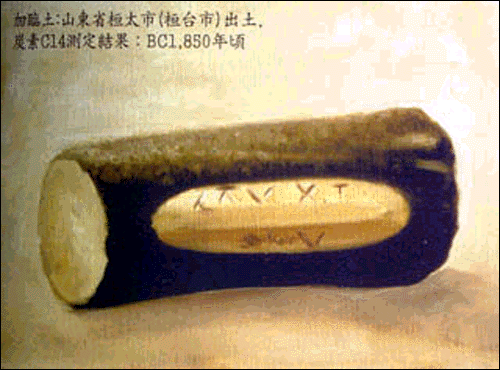2019. 2. 6. 03:09ㆍ글씨쓰기
기자 본향으로 돌아가다.
ㆍ기자조선, 中
제후국 아닌 동이족 독립국
BC 1046년. 주나라 무왕이
은(상)의 주왕(紂王)을 죽이고 은(상)의 554년 역사를 종식시켰다.
이것은 동북아 고대사의 판도를 뒤바꾼 대사건이었다.
한족(漢族)의 하(夏·BC 2070~BC 1600년)를 무찌르고 동아시아의 주인공이 된 동이족의 천하가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한족(하)~동이족(은상)~한족(주)으로….

베이둥 방정(사각 솥) 속 바닥에는 ‘기후(箕侯)’ 명문
그 과정은 너무도 드라마틱하다.
주 무왕은 주나라의 수도인 펑이(풍읍·豊邑, 산시성 치산·岐山 부근)에서
전차 300대와 용·갑사 4만5300명을 직접 이끌고 출정했다.
그러자 주왕의 학정에 못이긴 은(상)의 제후들도 전차 4000여대를 지원했다.
은 주왕은 70만 대군을 동원, 그 유명한 무야(목야·牧野, 허난성 지셴·汲縣
부근)에서 대치한다.
하지만 전쟁은 너무도 싱겁게 끝난다.
은 주왕의 학정에 몸서리를 친 은나라 군사들이 주 무왕의 군사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은나라 군사들은 창을 거꾸로 쥔 채(倒兵·자기 쪽을 향해 공격한다는 의미) 배반한 것이다.
결국 은 주왕은 분신 자살했고, 그의 애첩 달기는 목을 맸다.
‘사기’ 주본기는 “은(상)나라 사람들이 모두 교외에서 무왕을 기다렸고, 두 번 절을 하며 머리를 땅에
조아렸다”고
썼다.
‘사기’는 은 주왕의 폭정에 시달린 은나라 사람들이 주 무왕의 정벌을 반겼다는 투로 썼다.
굴복하지
않은 기자(箕子)
과연 그랬을까.
‘사기’를 꼼꼼히 살펴보면 은 백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주 무왕은 은나라 사람들을 달래려 몇가지 위무 정책을 단행한다.
은(상)의 3인(仁) 중 한 사람인 기자(箕子)를 석방시키고, 은 주왕의 아들인 무경(武庚)을 제후(諸侯)로
봉하면서 은나라 유민(은유·殷遺)들을 다스리라고 명했다.
은나라 역법(曆法)까지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특전까지 베푼다.
역법은
정권의 상징. 그런데 은의 역법까지 쓰라고 했으니 얼마나 은나라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인가.
그러면서도 2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왕의 친동생들인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무경의 사부로 임명, 감시토록 한 것이다.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했는데도) 무경이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음험한 마음을 품을까 무왕의 동생들인 관숙과 채숙으로 하여금 그를 보좌케 하였다.”
(사기 위강숙세가)

옆면에는 24자의 명문이 각각 새겨져 있다.
무왕의 불안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무왕의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은나라 유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기자(箕子)를 몸소 찾아가 천하의
상도(常道)를 묻고 유명한 ‘홍범구주(洪範九疇)’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지만 이종족(異種族)인 은나라 백성들의 민심을 잡는 것이 녹록한 일은 아니었다.
우선 기자를 조선에 봉했지만(武王乃封箕子於朝鮮), 그를 신하로 여기지 않았을 만큼(而不臣也) 경외했다.
이것은 해석에 따라 기자가 무왕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했다(不臣)는 뜻으로도 된다.
여하간에 기자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다.
기자가 폐허로 변해버린 인쉬(은허·殷墟)를 지나다가 맥수지가(麥秀之歌)를 짓자, 그 노래를 들은 은나라
유민들이 구슬피 울었다는 대목(사기 송미자세가)이 있다.
은나라 백성들의 민심이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는가.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었다(以暴易暴兮)”는 백이·숙제의 비난이 당대 여론의 주류였을 것이다.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한 스트레스가 컸을까.
무왕은 은나라를 멸한 지 3년 만인 BC 1043년 병으로 죽고 만다.
나이 어린 왕(성왕·成王)이
등극하자 무왕의 동생(성왕의 삼촌)인 주공(周公) 단(旦)이 섭정에 들어간다.
끝까지 저항한 망국의 은(상)
백성
이때 문제가 생긴다.
은나라 제사를 이은 무경(은 주왕의 아들)과, 무경의 감시자였던 관숙과 채숙(둘 다 역시 무왕의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성왕을 대신해 섭정에 나선 주공이 권력을 찬탈할까 의심했던 것이다.
셋은 의기투합했고, 망국의 한을 품은 은나라 사람들이 반란군 세력으로 나섰다.
동이족 계열인 회이(淮夷·산둥 남부 지역의 동이족) 사람들이었다.

24자 명문은 “정해(丁亥)일에 ‘회’가 ‘목’이라고 하는 곳에서 右正이란 관직을 가진 ‘문’에게 관패(串貝)
한 조와 붕패(朋貝) 200개를 상으로 내렸다.
이에 ‘문’이 ‘회’에게서 받은 상사(賞賜)를 칭송하기 위해 어머니 모기(母己)의 제사를 지낼 제기(사격형
큰 솥·方鼎)를 만들어 기념한다”고 해독할 수 있다.
바닥의‘기후’명문과 함께 해석하면 ‘회’라는 인물은 기후, 즉 기자족의 일원임을 알 수 있다.
‘箕侯亞 ’ 명문 가운데는 시호를 뜻하는 상형문자로 보인다. 명문중 ‘기후’를 둘러싼 글자는 亞로 해석
되는데,‘기후’라는 작위를 내렸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孤竹)’명 청동기는 백이·숙제의 고죽국을 알려주는 고고학 자료이다. | 이형구 교수 해석
하지만 반란군은 진압되었고, 은나라 백성을 이끈 무경과 관숙은 주살되었다.
은 유민의 저항에 놀란 주 성왕은 은나라 세력을 둘로 쪼개 약화시켰다.
은말의 3인(仁)이었던 미자(微子)를 망한 은(상) 왕조의 후사로 삼았으니, 그것이 바로 송(宋)나라다.
또 주 무왕의 다른 동생인 강숙(康叔)을 봉해 은유(殷遺)들을 맡겼다.
강숙과 은 유민은 인쉬(은허)에 거주했는데, 이것이 위(衛)나라다.
“은나라의 저항이 끈질겼어요. 성왕 때까지도 왕이 과거 은나라의 세력과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
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은을 멸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이형구 선문대 교수)
사기 주본기에 “성왕이 은의 잔여 세력을
소멸시킨 뒤에야 비로소 예의와 음악이 바로 잡히고 흥성해졌다”
고 했으며, 그 뒤에도 “동이를 정벌하고…”하는 대목이 이어지는 걸 보면 은과 동이의 저항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자조선은 중국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왕에게
‘홍범구주’의 가르침을 준 기자는 어디로 떠났을까.
사기는 분명히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무왕이 기자를 (존경한 나머지) 신하로 부르지 않았든지, 아니면 신하이기를 거부했든지 어쨌거나
기자는 무왕의 품을 떠났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자. 기자는 과연 주나라의 제후국이었을까.
이형구 교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한다.
“주나라의 제후국 이름을 보면
한결같이 진·한·위·노·제·송·채 같은 단명(單名)이잖아요. 그런데 조선(朝鮮)
은 복명입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자기 영역 밖의 종족이나 나라에 대해서는 복명을 썼거든. 조선, 선우, 중산, 흉노,
선비, 오환처럼…. 그러니까 주나라는 기자와 기자조선을 외국으로 친
겁니다.”
그러고보니 사마천의 ‘사기’는 기자와 관련된 기록을 ‘기자세가’가 아니라 ‘송미자세가’에 아주 자세하게
담았다.
만약
기자조선을 중국의 역사로 쳤다면 ‘기자세가(箕子世家)’라 해서 별도의 꼭지로 처리했을 것이다.
공자는 그렇다치고, 실패한 반란의
주인공인 진섭(陳涉·반란을 일으켜 秦나라를 무너뜨린 인물)마저 세가
(제후국의 흥망성쇠를 담은 것)에 담은 사마천이지 않는가.
‘춘추필법(春秋筆法)’으로 무장한 사마천이라면 홍범구주로 무왕을 가르쳐 결과적으로 주나라 건국정신의
토대를 쌓은 기자와 기자조선의 역사를 당연히 세가에 담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중국이 아니기에 차마 세가에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요즘 중국의 동북공정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도 기자가 가공 인물이며, 따라서 사마천의 ‘사기’가 거짓이라는 해석이 팽배한데요.
기자가 대동강 유역까지 진출해서 기자조선을 세웠다는 것에 거부감이 들어 그런 측면도 있고, ‘기자조선
인정 = 소중화 = 사대주의’라는 조선시대 이래의 역사 인식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또한 중국과 우리의
역사를 떼어놓으려는 일제 관학자들의 그림자도 아직 남아 있고….”
그런데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기자를 거부하려는 시각이 있다면,
기자의 신분이 종족적으로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기자에 대한
‘사기’의 기록은 과연 거짓인가.
“이미 기자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노나라 태사 좌구명이 쓴 역사책) 희공 15년조(645년)에
출현합니다.
또하나 사기의 정확성은 정평이 나있잖아요.”
‘있는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는 많지만, ‘없는 역사’를 있다고 하는
법은 드물다. 더욱이 1899년부터 확인된
은(상)시대의 갑골문을 해독한 결과 사기 은본기에 나온 은(상)나라 왕의 이름들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BC 90년 무렵 완성된 사기가 진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사기’ 주본기, 송미자 세가와 노주공세가,
위강숙세가 등에
나타난 기자의 기록은 사실로 봐야 할 것 같다.
가자! 본향으로

자, 이젠 기자의 행방을 쫓아가자. ‘기자조선의 존재’를 논증한 이형구 교수가 주목한 곳이 바로 카줘셴
(喀左縣) 베이둥(北洞) 유적이었다.
“기후(箕侯)와 고죽(孤竹)명 청동기가 나온 두 곳의 유적 거리가 불과 3.5라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기자조선의 대동강 유역설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중국학계는 ‘기후’명을 기자로 해석하지 않았거든.
나는 거의 붙어있는 두 유적의 관계를 흥미롭게 여겼는데, 바로 두 제후국이 시간 차를 두고 계승한 것
으로 보았어요.”
은말주초(殷末周初)의 명문 청동기는 비단 베이둥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다.
카줘셴 산완쯔(山灣子)·샤오좐쯔(小轉子)·샤오보타이거우(小波汰溝)와 이셴(義縣) 사오후잉쯔(稍戶營子)
교장갱 등에서도 나왔다.
그런데
베이둥에서 나온 청동기의 ‘기후’와 ‘고죽’ 명문 외에도 산완쯔·샤오좐쯔·샤오보타이거우 등에서는
숙윤(叔尹), 술(戌), 백구(伯矩), 어(魚), 주(舟), 차(車), 사(史), 아(亞), 윤(尹), 채(蔡), 사벌(史伐),
과(戈) 등 여러 씨족들의 징표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은(상)이 망한 뒤 기자가 주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여러 씨족들을
이끌고 동북으로, 동북으로 향했다고 보면…. 그리고 머나먼 조상 때부터(훙산문화 시절부터) 하늘신과
조상신 제사를 끔찍이도 모셨던 그들은 신주 모시듯 했던 청동예기(방정·뢰 등)들을 남부여대(男負女戴)
하고 옛 고향으로 떠났다고….”(이형구 교수)
이와 관련, 1930년대 인쉬 발굴을
총지휘한 푸쓰녠(부사년·傅斯年)의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은상의 선조가 동북에서 황허 하류로 와서 나라를 건국하고, 은이 망하자
기자(箕子)가 동북(고향)으로
돌아갔다.”(동북사강·東北史綱)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왕궈웨이(王國維)도 “은이 망한 뒤 기자는
선조의 땅으로 돌아갔다(從先王居)”고
했다.
명나라 사람인 함허자(涵虛子)는 ‘주사(周史)’를 인용하면서 “기자는 중국인(즉 은나라 유민) 5000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또 하나 ‘수서(隋書)’ 배구전(裵矩傳)을 보면 “고려(고구려)의 땅은 본래 고죽국이었다.
주나라가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기자가 망국의 눈물을 흩뿌리며 은(상)의 백성들과 함께 험난한 옌산(燕山)을 넘어 도착한 곳이
그들의 본향인 고죽국, 바로 조선
땅이란다.
< 선양 | 이기환 선임기자 lkh@kyunghyang.com>
[실증] 창락현(昌樂縣)은 기자 일행이 조선으로 건너기 위한 경유지였다.
이곳에서 최근 신시문자로 추정되는 동이갑골문 발견되었다.
창락현(昌樂縣)은 동방의 성인이신 기자께서 장도로 들어가는길에 잠시 머물렀던 경유지다.
이곳은 장도와는 거리가 천여리나 떨어져 있지만 등주수도인 험독의 거쎈물길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
에서 배를 띄워야 멀리 우회하여 건널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락현이 장도를 출입하는 관문이라는 얘기다.
기자께서 조선으로 가는길에 따르는 종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기록은 <속 창락현지>를 통해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상서주소>라는 <서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곳 역시 신시의 영향권에 있었다고 보는것이 상식일것이다.
문자가 만들어진 시대가 대체적으로 치우시대에 해당한다고 한다.
치우가 다스리던 청구국은 지명의 이름이 영구(營口)로 바뀌어 바로 인근에 있었다.
그리고 한웅께서 신지 혁덕에게 문자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창힐이 만들었다고 하는 가림토도 멀지
않은곳 환대에서 발견되었다.
《상서주소 권4고증》
해대지역(海岱地域)에 있던 청주는 요(堯)나라때 바다를 건너 요동과 소통하던 곳이다.
호위가 말하기를 아직 의심이 없는건 아니지만 한무제가 열었든 낙랑.현도 2군이 모두 옛날 우이지역에
있던 청주 지역이다.
우이는 희중이 삶을 열었든 곳이고,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나 불응하고 밖으로 나간곳이다.
단 요동에 있는건 아니다.
海岱惟青州疏堯時青州當越海而有遼東也○胡渭曰疏亦未盡疑漢武所開樂浪元菟二郡皆古嵎夷之地在
青州之域者嵎夷羲仲所宅朝鮮箕子所封不應在化外先儒但云有遼東非也
1.환대--가림토문자 2.왜팡시--동이 갑골문자 3.창락--창락골 각문자가 발견된곳
3번의 창락은 기자일행이 장도로 건너기위해 머물럿던 곳이고 백이숙제가 주나라의 간섭을 피하여
은신하던 곳이다. 후에 위만이 교역을 위하여 출입하던곳도 이곳이다.
|
신시의 가림토 문자는 창락현의 좌측에 있는 환태(桓台)에서 발견되었고, 동이갑골문은 창락현의 우측에 있는 웨팡에서 발견된것이다. 그리고 상서의 주석에서 말하는 기자가 주무왕의 제의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한 곳이 창락과 같은 지역에 있는 청주(靑州)다. 창락에서 내주만으로 내려가면 연태로 향하는 항로가 연결되지만 기자 당시에 이미 바다가 형성되었는지는 알수가 없다. 《상서》우공편에서 말하는 <흑수는 동으로 흘러 삼위산에 이르러 남쪽바다로 들어간다>고 하는 기록은 바다가 형성되기 전에도 이곳에서 배를 타면 흑수가 직접 사문도(장도)로 연결됨을 알수 있다. 청주는 이정기가 치청절도사로 부임하여 제나라를 건국한 지역이고, 백제와 신라,고려까지도 자사등을 임명했던 기록들이 보인다. 동쪽으로 래주에는 마안산(馬鞍山)이 있는데 원래 래이(萊夷)의 발상지었다고 하고 이 마안(馬鞍)이라는 지명이 장산군도로 옮겨져 마한땅에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산동성에서 배달국시대의 갑골문 발견
| |||
은나라보다 천년이상 앞선 동이의 갑골문자 발견 | |||
|
대종언어연구소
| |||
산동성에서 은허(殷墟)갑골문보다 천여년 훨씬 이전의 갑골문인 동이갑골문(東夷甲骨文)이 발굴되었다고 발표되었다. 산동 용산문화 중만기 유물로 지금으로부터 약 4,000 ~ 4,500년(치우배달국시대) 전의 것이고, 중국의 전문가들이 자기네 것이 아닌 동이의
문자(東夷文字)라고 발표하였다. 부족중 하나였던 기원전 1600년경에 상나라(은殷)을 세운 상부족의 은허갑골문(殷墟甲骨文)의 모체라는
것이다.
|
神秘东夷甲骨文有了“名份”
http://www.sina.com.cn 2008年08月15日07:37 大众网-齐鲁晚报
□记者高祥森
本报昌乐8月14日讯本报7月13日刊登的《神秘东夷甲骨文惊现潍坊?》引起国内外强烈关注。
最近中国文字研究权威专家、中国社会科学院历史所研究员王宇信教授等人聚集昌乐,经过研究,
专家们初步认定这些神秘甲骨上所附的“行列整齐”的符号为中国早期文字,
在出现时间上应早于河南安阳殷墟甲骨文,为区别起见,专家把这些神秘符号命名为昌乐骨刻文字。
산동성 창락현의 신비 갑골문의 수수께끼를 풀다 : 안양갑골문보다 훨씬 빠른 시기이다.
(山東昌樂神秘甲骨文解謎:比安陽甲骨文更早)
제로만보(齊魯晚報) 의 7월 13일 간행 지면에 등재된 <신비의 동이갑골문(東夷甲骨文)이 산동성
유방(濰坊)에서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라는 보도가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과 집중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의 중국 문자연구의 권위있는 전문가인 ‘중국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연구원인 왕우신교수
등이 산동성 창락현에 모여 연구경과를 토의했고,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신비한 갑골위에 ‘행렬정제’된
부호가 중국의 초기문자라고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발굴시기는 하남성 안양시에서 발굴된 ‘은허갑골문(殷墟甲骨文)’보다 훨씬 이전의 것으로 그 기원이
판명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이 ‘신비부호’의 이름을 ‘창락골각문자(昌樂骨刻文字)’라 명명하였다.
自2004年以来,昌乐县收藏爱好者肖广德在昌乐县袁家庄及其附近的纪台等古文化遗址上发现并收集
了一批当地老百姓翻地挖出的带字骨头。2007年7月,山大美术考古研究所所长、博士生导师刘凤君
教授开始对带字骨头进行研究,他认为这批资料极为重要:如果真是从古文化遗址上收集来的,
它应是山东龙山文化的遗物,是中国早期的文字;如果是后人刻的,应该有摹本,这摹本应是龙山文化
的遗物,应该把它找出来。刘凤君在肖广德家里,又看到了一百多块刻字的骨头。刘凤君认为这批刻字
的骨头是山东龙山文化中晚期的遗物,距今约4000—4500年,属东夷文字。
7月30日,中国古文字研究权威专家、中国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研究员、中国殷商文化学会会长
王宇信教授等5人聚集昌乐,观看了大量的骨刻文字照片和实物,举行了一次座谈研讨会。与会专家一
致赞同刘凤君的鉴定意见,认为这批文字是比安阳甲骨文更早的一种原始文字,认为它与安阳占卜的甲
骨文不同,是一批记事骨刻,应称为“昌乐骨刻文字”。与会专家认为它是继安阳甲骨文后的又一重大发现。
有关专家认为,昌乐骨刻文字的发现表明,中国早在4000多年前就已有了作为文明标志的文字,使传说
中的龙山文化时期成为信史。另外,昌乐骨刻文字和殷墟甲骨文类似,都是刻在兽骨或龟甲上,这和以
纸草、泥板、石板为文字载体的古埃及、古巴比伦、古印度文字体系明显不同;它的出现,使有中国文
字记载的历史可能再次提前。
记者 高祥森
월 30일 중국고문자연구의 권위있는 전문가이며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연구원이고 중국은상
문화학회(中國殷商文化學會)의 회장인 왕우신(王宇信)교수 등 5인이 창락현에 모여 대량의 골각문자의
사진과 실물을 살펴보았고 일차 좌담연구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류봉군(劉鳳君)의 감정 의견에 모두 찬성동의하였고,
이 문자들은 안양갑골문자와 비교해 훨씬 이전의 일종의 원시문자(原始文字)로 인정하였고,
안양점복의 갑골문과는 서로 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를 기사골각(記事骨刻)으로 창락골각문자(昌樂骨刻文字)로 칭하기로 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것은 안양갑골문 발견된 이후에 이어진 또 하나의 중대한 발견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7月30日,中國古文字研究權威專家、中國社會科學院曆史研究所研究員、中國殷商文化學會會長王宇
信教授等5人聚集昌樂,觀看了大量的骨刻文字照片和實物,舉行了一次座談研討會。
與會專家一致贊同劉鳳君的鑒定意見,認爲這批文字是比安陽甲骨文更早的一種原始文字,認爲它與安
陽占蔔的甲骨文不同,是一批記事骨刻,應稱爲“昌樂骨刻文字”。
與會專家認爲它是繼安陽甲骨文後的又一重大發現。
관련 전문가들의 인정이 있음으로 해서 창락골각문자(昌樂骨刻文字)의 발견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중국 초기인 4,000여년 전에 이미 문명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전설적인 용산문화시기가 역사임을 믿게 하였다.
그밖에, 창락골각문자와 은허갑골문자가 유사한데 모두 이것은 짐승의 뼈나 거북등껍질(龜甲) 위에
새겨졌으며, 이것과 지초(紙草), 니판(泥板)-진흙판, 석판(石板)위에 새겨서 문자 체계를 이룬 고대
이집트, 고대 바빌로니아, 고대 인도의 문자체계와 다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의 발견은 중국 문자 사용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앞당길 수 있게 했다.
有關專家認爲,昌樂骨刻文字的發現表明,中國早在4000多年前就已有了作爲文明標志的文字,
使傳說中的龍山文化時期成爲信史。
另外,昌樂骨刻文字和殷墟甲骨文類似,都是刻在獸骨或龜甲上,這和以紙草、泥板、石板爲文字載體
的古埃及、古巴比倫、古印度文字體系明顯不同;它的出現,使有中國文字記載的曆史可能再次提前。
(高祥森)
[기고
: 대종언어연구소]
[실증]수유(須臾)와 신기루(蜃氣樓)의 비밀에는 기자족이 있었다
호종동순일록=扈從東巡日錄)》의 기록에 의하면 수유(須臾)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같이 하고있다.
"수유란 단순히 한순간을 표현한 뜻이 아니라 한순간동안 벌어지는 신기루의 장소를 표현한 "수유대사
=須臾臺木+射"라는 표현을 쓴것이었다"
이대목을 풀이하면 억울하게 위서로 의심을 받았던 《환단고기》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겸하여
《요사》<지리지>가 제기한 평양성은 암연현의 서남쪽에 있다는 수수께끼까지 풀어볼 수 있었다.
《요사》<지리지>가 발표된 뒤 천 수백년의 세월동안 풀지못했던 수수께끼가 비로서 풀린것이다.
수유(須臾)와 기자는 과연 어떠한 관계일까
"임오년에 연나라 사람 배도(倍道)가 쳐들어 와서
안촌골(安村忽)을 공격했다.
또 험독에서 노략질하니 수유(須臾)의 사람 기후(箕詡)가 자식과 제자들 5,000명을 데리고 와 싸움을
도왔다.
이에 군세가 떨치기 시작하더니 곧 진·변 2한의 병력과 함께 협격하여 이를 대파하고 또 한쪽으로
군사를 나누어 파견하여 계성(薊城)의 남쪽에서 싸우려 하니, 연나라가 두려워하며 사신을 보내 사과
하매 대신과 자제를 인질로 삼았다."
(임승국 역주, 《환단고기》, 정신세계사, 226쪽 참조)
*이 대목에 나타난 수유를 보면《한단고기》가 위서이던 아니던 지역명을 시사하는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전에서 검색된 수유라는 용어는 15개나 나오는데 기자국과의 관계를 시사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 가 없다..
혹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은폐하기에 방해가 된다면 살려둘리가 없다.
하여 필자가 근거사료를 찾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그리고 수유를 해석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어디까지나 인용자의 주관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다.
왜냐면 같은 수유를 놓고도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어려운 사료가 발굴되면 《만주원류고》의 역주자인 장준근님의 도움을 받어 바른해석
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음에 소개하는 '수유(須臾)라는 용어는 필자가《호종동순일록(扈從東巡日錄)》란 책에서 발견한것
이다.
필자는 이 자료로서 기자가 등주 건너편의 사문도(삼신산)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이곳이 고조선이었던 동표지역이고 우이지역이다.
그리고 한나라때 낙랑군이고, 옛날의 평양성이었다.
따라서 해상의 공중에 신기루가 나타나 약 40여분의 쑈를 벌리다 사라지던 지역은 한반도에 있었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다.
수유란 40여분의 순간을 말한다.
그런데 수유대사(須臾臺木+射)란 대목을 눈여겨 보면 신기루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의 운명이 약탈자들의 감시속에서 좌지우지되던 시대에 음지에 숨어서
기록되었던 《환단고기》
가 위서라는 사실을 한사코 밝히려는 저의가 무엇일까?
사실을 기록한 사서들은 모두 약탈되어 회진되었다는 사실은 고조선의 역사를 은폐하기 위한것이었다.
때로는 약탈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자국의 위정자들에 의해서 말이다.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는 국가 서고의 자료들중에서 왜 수유(須臾)가 기자와 관계가 있다는 자료는 찾을
수가 없는것일까.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는 학자들이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조건을 연구하여 발표하면서도 그
《환단고기》가 품고있는 수유의 진실은 밝히지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의 학계에서 조차 '수유'는 기자와 얽힌 사실을 감지하고 여러가지 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한국의 일부 사학자들은 《환단고기》를 비판할 자격이나 있는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들이 진정한 학자라면 어렵게 살아남은《환단고기》가 진서라는 사실을 연구하여 밝히는것이 급선무
일것이다.
《환단고기》<북부여기>2세 단군 모수리 재위 25년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국내의 공인된 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수유(須臾)에 대한 기록이다.
그것도 준왕이 위만에게 조선을 내어주고 바다로 떠난 자리를 수유라고 하고있는것이다.
식민사학자들이 한사코 준왕은 대동강 평양에서 바다로 떠났다고 하였는데 준왕이 떠난 평양은 수유
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그런것조차 연구도 없는 사람들이 책 전체의 취약한 부분만을 침소봉대하여 위서운운하는 모습은
측은하기까지 하다.
[二世檀君 慕漱離 在位二十五年
丁未元年番朝鮮王箕準久居須臾嘗多樹恩民皆富饒後爲流賊所敗亡入于海而不還]
"정미원년 번조선 왕은 오랫동안 수유에 있으면서 항상
많은 복을 심어 백성들이 매우 풍부하였다.
뒤에 떠돌이 도적떼들에게 패하여 망한뒤 바다로 들어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은 중국사서들을 통해서 살펴본
자료들이다.
[1] 먼저 기자의 묘비에서 발견한 기자의 호칭에대한 자료인데 기자를 원래는 수유라고 불렀는데
서여로 고쳐 기록하였다는 설명이고,그렇지만 중국어로 읽히는 발음은 역시 수유 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니까 이 묘비는 수유라는 이름은 기자의 첫번째 호칭이라는것 외에는 큰 뜻을 찾을 수는
없었다.
《기자묘석기(箕子廟石記)》는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었던 유종원(柳宗元)이 쓴 《기자묘지(箕子墓志)》
에 관해 쓴 글인데 우리에게는 《고문진보(古文眞寶)》로 익숙하듯이 중국에는 《고문관지(古文觀止)》란
글 모음집이 있는데 그 글에 들어 있다.
한편 기자묘비(箕子墓碑)를 쓴 유종원의 문집인 《유종원집(柳宗元集)》에 의하면 기자의 이름이 원래
"수유(須臾)"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기록에 의해 "서여(胥餘)"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수유(須臾)나 서여(胥餘)나 중국어 발음으로는 모두 xu yu로 읽혀져 이상할 것이 못 된다.
(중화서국, 《유종원집(柳宗元集)》 제1책, 119쪽 참조)
[이 자료는 중화서국에서 펴낸 《유종원집(柳宗元集)》에서 캡쳐한 것이다.
이 비의 《교감기(校勘記)》에 의하면 이 비문의 아래에 기자의 이름은 서여(胥餘)이다.
서여(胥餘)는 원래 "수유(須臾)"로 써 있던 것을 세채당본(世綵堂本) 및 《사기(史記)·송미자세가
(宋微子世家)》에 대한 사마정의 《색은(索隱)》에 근거해서 수유(須臾)를 서여(胥餘)로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원래의 이 비문에는 기자의 이름이 서여가 아닌 수유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여나 수유는 중국어로는 같은 발음으로 suyu라 한다.
그뿐 아니라 수유는 기자조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자의 이름 중 하나이다.] 장진근 역
수유(須臾)란 순간이란 뜻이다
두번째는 고염무의 일지록에서 소개한 수유는 단순히 순간이나 찰라의 뜻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 기자
와의 관계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의 출전은 고염무의 《일지록(日知錄)·수유편(須臾篇)》에 나오는 말이다.
그가 제시한 세가지의 전거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다음은 《호종동순일록=扈從東巡日錄)의 수유(須臾)에 대한 부분이다.
(전기 일부를 생략하고 해당부분을 추출하였다.)
"동서 하권 정미일(丁未日)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전날인 병오일(丙午日)에는 왕보하(王保河)에서
주필했다.
이 날은 산해관으로 장차 들어 가려고 환희령(歡喜嶺)을 통과했는데 산해관 동쪽 3리에 있으며,
일명 서황령(恓惶嶺)이라는 곳으로 관을 나가는 사람들은 이 곳에 올라 당황하여 허둥지둥하므로
서황령이라 하고, 일단 관에 들어와서 이곳에 오른 자는 기쁨에 넘치기 때문에 환희령이라고 한다.
이날 산해관 서쪽 8리쯤에 있는 징해루(澄海樓)에 구경하였다.
이십리포에서 주필하면서 《징해루관해가(澄海樓觀海歌)》를 지었다고 한다.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황제는 관해시(觀海詩)를 쓰고 작자는 징해루(澄海樓)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했다고나 할까.
그 노래를 짓기까지의 서문은 아래와 같다.
한무제가 동순한 것은 《한서 · 제사지》에 나온다.
괄호한 부분은 원래 있던 내용인데 누락이 되어 원문의 뜻을 복원해 내려면 이 부분을 살려서 번역
해야 문장의 전후 관계가 확연해 진다.
昔漢武帝東巡海上, 方士言蓬萊諸神若將可得, 遂欲自浮海求蓬萊, 群臣敢莫能止。 夫武帝以英明之主, 惑于方士,
爲後人所譏笑。 比者, 左道朱方旦持其邪說, 蠱世惑民, 皇上毅然誅之, 以正人心, 天下稱快。 孟子曰: 經正則庶
民興,. 足徵人主好惡, 關于治蘭不淺, 是日 捧讀御製觀海詩, 實寓此意也. 駐蹕二十里鋪, 作澄海樓觀海歌:
"옛날 한무제가 해상을 동순할 때, (태산을 봉한 뒤에 바람과 비를 만나지 않자) 방사(方士: 도사)들이
어수선하게 말하기를 봉래(蓬萊)의 여러 신선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이윽고 황상은 흐믓해
하면서 신선들을 만나 보았으면 하고 또 다시 동쪽 해상으로 가서 멀리 바라 보았다.
봉거(奉車) 자후(子侯)가 갑짜기 병이 나서 하루 사이에 죽어버렸다.)
마침내 몸소 바다로 건너가서 봉래에서 신선들을 만나려고 하매, 군신들이 감히 이를 막을 수 없었다.
대저 무제는 영명한 군주이신데 방사들에게 현혹되다니 후인들에게 조소를 당할 만하다.
최근에 사교의 무리인 주방단(朱方旦)이 그 요사한 설을 믿고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것을 황상께서
목을 베어 인심을 바로 잡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후련하다는 말을 들었다.
《맹자(孟子) · 진심(盡心)》 장구에 이르기를, "법도가 잡히면 백성들에게서 착한 기풍이 일어난다
(經正庶民興)"고 하였는 바, 이는 임금의 호오(好惡)가 치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날, 황상께서 지으신 《관해시(觀海詩)》를 받잡아 읽어 보니 실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황제께서 이십리포(二十里鋪)에서 잠시 머물러 숙박하였다.
《징해루관해가(澄海樓觀海歌)》를 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승(齊乘)》의 산천조에 기록된 해시신루(海市蜃樓)에 대한 설명이다.
《제승(齊乘)》의 산천조에 나오는 사문도(沙門島)에는 해시부(海市附)라고 주기가 되어 있다.
해시(海市)는 사전에 찾아보면 해시신루(海市蜃樓)라고 하였다.
우리가 흔히 들어오던 신기루라는 말이다.
해시신루(海市蜃樓)란 말은 송나라의 심괄(沈括)이라는 사람이 쓴 《몽계필담(夢溪筆談)》에도 나오는
유명만 말이다.
최인호의 《상도(商道)》에서도 역시 봉래해상의 신기루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登州四面臨海, 春夏時遼見空際, 城市樓臺之狀, 土人爲之海市"
신기루(蜃氣樓)는 일종의 신기한 자연현상이다. 사람들이 해변이나 사막 지역에 있을 때 멀리 있던
산천이나 성곽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표 부근의 저공층과 상공에 더운 공기층이 있고 그 사이에 차가운 공기층이 끼여
있는 경우에 나타나게 되나 아직 그 정확한 실태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한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천관서(天官書)》에 의하면, "바닷가의 대합은 기를 토해 내어 누대를 형성하고,
광야에서 토해 내는 기(氣)는 궁궐을 형성한다(海邊蜃氣象樓臺, 廣野氣成宮闕然。)"라고 말하여 해변
과 육지에서의 신기루 현상을 기록하였다.
다만, 이러한 기록은 대부분 교룡(蛟龍)과 신합(蜃蛤: 대합조개)가 토해내는 기운이 응결된 것이라고
그 생성원인을 해석하여 때때로 미신적 색채를 띠고 있다.
설사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도 구양수는 여전히 귀신이 공중을 지나는 기괴한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심괄의 《몽계필담(夢溪筆談)》은 등주(登州)에서 일어나는 신기루 현상을 기록하였는데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심괄은 이미 신기루 현상이 교신(蛟蜃)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를 품고, 전통적 해석에 대해 의혹을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해경(山海經)》을 역주한 원가(袁珂)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인시(大人市)란 생각건대 《대황동경(大荒東經)》에 이르기를, '파곡산(波谷山)이란 곳이 있고
대인국(大人國)도 있다.
대인시(大人市)가 있는데 그 이름을 대인당(大人堂)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양신(楊愼) · 학의행(郝懿行) 등은 모두 해석하기를 등주(登州)의 해시신류(海市蜃樓)의 조화라고
하였고, 말하기를 '지금 등주(登州) 바닷속에 주도(州島)에서는 봄과 여름이 교차할 때 늘 성곽과
시전(市廛: 저자의 가게)이 보인다거나 인물(人物: 사람과 물건)들이 왔다갔다 하기도 한다거나 비선
(飛仙)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는 등 갑자기 조화를 이루는데 현지인들은 이를 해시(海市)하고 한다
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운운하였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원가 역주, 《산해경전역(山海經全譯)》, 귀주인민출판사, 260쪽 참조)
이상으로 등주의 봉래해상에서 벌어지는 신기루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수유족으로 알려진 기자족에 대한 한씨족보의 기록이다.
한씨 족보에는 '태조 문성대왕 기자는 성이 자씨로 휘는 수유,
또는 서여이며 상(은나라)제 무을의 둘째 아들로
휘는 이자이다' 라고 적고 있다.
太祖 <文聖大王> <箕子> 姓<子>氏
諱<須臾>又諱<胥餘>. <商>帝<武乙>次子. 諱<理子>也.
위에서
보면 기자는 자수유, 혹은 자서여임을 알수 있다.
<殷>志堅罔僕逐東, 出<朝鮮>都
<平壤>國號<後朝鮮> 敎民八條, 變<夷>爲<夏><周成王>戊午薨.
在位四十四, 壽九十三 (BC 1082 년). 墓<平壤城>北<王荇山> <負子原> 俗稱<兎山>.
三十六世<嘉德王>追尊爲王
'은나라가 망하자 종복들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쫓겨가 조선의 평양에 도읍하고 국호를 후조선이라
하고
백성들에게 8조를 가르쳤다.
이(夷)가 하(夏)나라로 변하니 주성왕 무오년에 돌아가셨다. 재위 44년, 93세를 사셨다.
묘는 평양성 북쪽 왕행산 부자원(묘도= 필자 주)에 있는데 속칭 토산이다.
36대 가덕왕때 추존돼 왕이 되었다.' 고 적고 있다.
위에서 보면 동쪽으로 쫓겨가 후조선을 열었다고 했다. 즉 이전에 조선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묘를 평양성 북쪽 왕행산 부자원에 썼다고 했다.
사기 집해는 기자묘가 기성(서화)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선의 평양성이란 기성을 가르키는
것일까? 어쨋든
기자는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고 36세 가덕왕이 추존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36世 <嘉德王> 諱<후> ,
<顯王>二十漆年 己卯(BC 342년)立 在位二十七年
....중략...
40世 <宗統王>
諱<丕>, 初諱<恤>, <秦王>政十五年 己巳(BC 232년)立 在位十二年
41世
<哀王> 諱<準>. <輿地勝覽>云<武康王>. <始皇>二十七年 辛巳(BC
220년)立.
<漢><惠帝>元年 丁未(BC 194년), <燕>人<衛滿>來侵,
率左右宮人, 浮海南出立國<金馬郡>今<益山>.
開國號曰<馬韓>, 在<平壤>爲王二十七年
다음 36세 이후 기록을 보면 36세는 가덕왕 후이고 40세는 종통왕 비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이 41세인데 즉 애왕 준(準)이다.
여지승람에 무강왕이라 하고 진시황 27년에 등극했는데 한 혜제 원년에 연인 위만이 침입해 좌우궁인
들을 거느리고 바다 남쪽으로 달아나 지금 익산인 금마군에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금 익산(益山) 금마군이란 주(注)는 금주(金州) 금마군을 왜곡한것이다.필자 주)
국호를 마한이라 했는데 평양에 있으며 27년간 왕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때 마한이 평양에 있다고 한 대목을 주시해야 한다.
준왕은 바다로 쫓겨나 금주(대련)금마군(금마저=마한도)에 정착하고 부여국 상장군 연타발로 하여금
평양에 성책을 쌓고 위만의 공격에 대비했다는 기록이 《한단고기》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준왕족은 당시
새로운 책성을 평양에 개척하고 상륙을 준비했다고 보아야 한다.필자 주)
이상에서 보면 기자는 처음에 왕이 아니었다가 36세 가덕왕때 추존된다.
그리고 40세가 종통왕 (기)비인데 후한서에 40여대가 지나 왕을 칭했다고 했으니 이 (기)비나 (기)준이
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단고기를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이 기비가 번조선의 왕이 되는 대목이다.
즉 '고리국 사람인 해모수가 웅심산에 내려와 은밀히 수유(須臾, 기자 이름)사람과 약속하고 옛 도읍
백악산을 습격해 천왕랑이라 했다.
이에 수유侯 기비(箕丕)를 번조선의 왕으로 봉했다.'는 것이다. 이 기비는 번조선의 73대 왕이 된다.
한단고기를 보면 수유족(기자족)은 기자 망명후 번조선을 위해 연나라와 싸우는 등 공을 세우는데
기원전 239년 기비는
해모수와 손을 잡고 쿠테타를 일으켜 번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록은 <사기>와 <후한서>에 기록되지
않은 공백을 채워줄뿐더러 후한서의 '40여대가 지나
왕이 되었으며 준왕은 위만에 패해 바다로 달아났다'는 기록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다.
《환단고기》<북부여기> 상에는 2세 단군 모수리 재위 35년에는 상장 연타발이 평양에 성책을
설치하고 위만의 공격에 대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준왕이 옮겨간 새로운 평양인것이다.
二世檀君 慕漱離 在位二十五年丁未元年番朝鮮王箕準久居須臾嘗多樹恩民皆富饒後爲流賊所敗亡入于
海而不還諸加之衆奉上將卓大擧登程直到月支立國月支卓之生鄕也是謂中馬韓於是弁辰二韓赤各以其衆
受封百里立都自號皆廳用馬韓政令世世不叛
戊申二年帝遣上將延타勃設城柵於平壤以備賊滿滿赤厭苦不復侵擾己酉三年以海城屬平壤道使皇弟高辰
守之中夫餘一城悉從糧餉冬十月立京鄕分守之法京則天王親總衛戌鄕則四出分鎭恰如柶 觀戰龍圖知變
也辛未二十五年帝崩太子高奚斯立
정미원년 번조선 왕은 오랫동안 수유에 있으면서 항상 많은 복을 심어 백성들이 매우 풍부하였다.
뒤에 떠돌이 도적떼들에게 패하여 망한뒤 바다로 들어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오가의 무리들은 대장군 탁을 받들어 모두 함께 산을 넘어 월지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다.
월지는 탁의 태어난 고향이니 이를 가리켜 중마한이라 한다.
이에 이르러 변 진한의 두 한도 역시 각각 자기들의 받았던 땅 백리를 가지고 수도도 정하고 나름대로
나라 이름을 정했는데 모두 마한의 다스림을 따르며 세세토록 배반하는 일이 없었다.
무신 2년 단제께서 상장 연타발을 파견하여 평양에 성책을 설치하고 도적떼와 위만의 무리에 대비케
했다.
이에 위만도 역시 싫증을 느꼈던지 다시는 침범치 않았다.
기유 3년 해성을 평양도에 속하게 하고는 황제의 동생 고진을 시켜 이를 수비케 하니, 중부여 일대가
모두 복종하매 그들에게 양곡을 풀어 주어 구제하였다.
겨울 10월 경향분수의 법을 세웠으니 서울도성은 곧 천왕이 직접 수비를 총괄하며 지방은 네 갈래로
나누어 군대를 주둔하도록 하니 마치 윷놀이에서 용도의 싸움을 보고 그 변화를 아는 것과 같았다.
신미 25년단제 붕어하시고 태자 고해사가 즉위하다.
기자는 풍백의 자손
우선, 주나라에서 망명온 기자(箕子)와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기자(箕子)는 다른 사람임을 명시해
두겠습니다.
기자조선은 다들 아시겠지만 단군조선 1000년 통치기간 후에 기자가 정권을 이어받아 다시 또
1000
년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군조선을 이어받은 기자는 주나라에서 망명온 기자가 아니라 아마도 풍백 운사 우사 중 풍백
의 자손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 箕의 뜻을 살펴봅시다.
1.
존한자사전
【기】키; 삼태기; 쓰레받기; 별 이름; 바람 귀신(風伯); 다리를 뻗고 앉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바람귀신이라고 하는 풍백(風伯)인데, 환웅이 나라를 세울때 개국공신이었던
풍백과 한자가 일치합니다.
2. 강희자전
여러가지 설명이 있는데 선택하여
써봅니다.
【書·洪範註】好風者箕星,好雨者畢星。바람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기성(箕星)이라고 합니다.
【註】箕伯,風師。기백(箕伯)은
풍사(風師)이다.
위 한자의 뜻으로부터 꼭 사서에 나오는 箕子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箕의 자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풍사(風師) 혹은 풍백(風伯)의 자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자를 풍백의 자손으로 볼수 있는 사서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원사화
獨藍侯者出諸家之右, 時常役率羣后, 以行國政。
유독 남후만이 제후들의 강성함 가운데에서도 뛰어나서 항상 모든 제후들을 거느리고 국정을 행하였다.
風夷則卽蚩尤(氏)之一族也。 풍이는 곧 치우씨의 일족이다.
蚩尤氏之族, 則占居西南之地。치우씨족들은 서남쪽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蚩尤氏之後, 封于南西之地, 巨野浩豁, 海天靚碧,
曰藍國, 宅奄慮忽.。 치우씨의 후손에게는 남서쪽의
땅에 봉하니, 거대하고 광활한 들녘에 바다는 고요하고 하늘은 푸르기에 남국(藍國)이라 이름하고
엄려홀(奄慮忽)에 자리잡아 다스리게 하였다.
치우씨는 단군조선 개국때 서남쪽의 땅에 자리를 잡았으며, 풍이라고도
불리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단군조선 1000년이 지나서 치우씨의 후손인 람국이 단군조선의 대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2. 환단고기
乙未五十二年右賢王高登薨基孫索弗婁襲爲右賢王 을미 52년(B.C.1286), 우현왕 고등이 죽으니,
그의 손자 색불루(索弗婁)가 세습하여 우현왕(右賢王)이 되었다.
二十二世 檀君 索弗婁 22세 단군
색불루이다.
이 기록은 우현왕의 아들 색불루가 대통을 잇는 기록인데 우현왕은 곧 단군조선의 서쪽에 있던 제후
국이므로 규원사화 기록과 마찬가지로 단군조선 1000년 후에 단군조선 서쪽에 있던 나라가 대통을
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규원사화와 결부시켜 생각하면 우현왕은 곧 치우의 후손의 나라인 남국이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
니다.
3. 환단고기와 규원사화 기록을 병행하여 보면...
-
환단고기
桓雄天皇使風伯釋提羅雖除鳥獸蟲魚之害
한웅천왕께서 풍백(風伯) 석제라(釋提羅)를 시켜 짐승과 벌레와 물고기의 해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 규원사화
但此時, 開闢不遠, 隨處草木荒茂‧鳥獸雜處,
人民艱困殊甚, 且猛獸‧毒蟲不時衝動, 人民被害不少.
神市氏, 卽命蚩尤氏治之.
이 때는 개벽한 지 아직 멀지 않은 때인지라, 곳곳에 초목이 무성하고 날짐승이며 들짐승이 어지러이
섞여 있어 사람들의 괴로움이 매우 심하였고, 더욱이 사나운 짐승과 독충들도 때를 가리지 않고
다투었기에 사람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신시씨는 곧 치우씨(蚩尤氏)에게 명하여 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 두개의 기록을 비교하여 보면 짐승들의 해를 제거한 것은 풍백이고 그가 바로 치우임을 알
수 있습
니다. (환단고기에 석제라라고 한 것은 아마 치우가 성씨이고 석제라가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환단고기에는 아래와 같이
직설적으로 남국은 풍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藍部之人一云風族 남부(藍部)의 사람을 풍족이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단군조선 1000년 후에 대통을 이은 것은 람국의 제후이며 이는 치우의 자손이며 치우는
환웅시대의 풍백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군조선 1000년 후에 대통을 이은 람국의 제후는 바로 풍백의 자손으로(風伯子孫) 다르게 쓰면
기백의 자손인데(箕伯子孫), 이를 간략하게 기록하여 箕子라고 쓰지 않았나 합니다.
혹은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아 몽골의 눈치를 보며 사서를 기록할때 풍백(風伯)의 자손이 단군조선의
대통을 이었다라는 사실을 箕子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알리고자 하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은 지나 사서에 기자가 조선에 갔다는 기록을 곡해하여, 사대하던 조선시대에 箕伯子孫을 고쳐 箕子
라고 쓰지 않았나 합니다.
곁가지로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발조선(發朝鮮)의 發, 번한(番韓)의 番을 신채호선생님은 불조선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위의 제
주장을 바탕으로 이는 파랗다의 "파"를 지나인들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조선과 번한 모두 람국(藍國)과 그 위치와 통치자로 보아 같은 나라입니다.
藍이란 쪽빛으로 파란빛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파란나라"를 지나인들이 그 구강구조가 미개함으로
인하여 단순히 發 혹은 番으로 적었는데 각각 지나인의 발음이 fa와 fan입니다.
(九山)
'글씨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왕희지 초결가 (0) | 2019.02.19 |
|---|---|
| 갑골문자보다 천년 앞선 동이(한민족) 골각문자 발표 外 (0) | 2019.02.06 |
| [스크랩] 신품사현 笙篁(대숲 황) 柳伸 (0) | 2019.02.01 |
| [스크랩] 신라 김생 (0) | 2019.02.01 |
| [스크랩] 여초 김응현 (0) | 2019.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