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inpha-ri Tomb No. 1 (진파리 1호분, 眞坡里 1號墳) |
|
개 요 |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
사신도를 그린 외간 무덤으로 벽화는 사신도를 비롯해서 벽화 전체에 생동감이 넘쳐 자유 분방하고 극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 축조는 6세기 후반, 귀족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
|
구 조 |
직경은 약 30미터, 높이는 남쪽에서 약 7미터이다 .연도와 묘실로 이루어진 단실 고분 서쪽으로 치우친
남쪽으로 향하였다.
|
|
벽화 |
벽화는 연도에 문지기를,묘실 네 벽에는 구름 사이에 사신을 그렸다. 천장에는 해.달.연꽃무뉘,구름무뉘와 덩굴무늬를 화려하게 표현했다. 진파리 1호분(眞坡里一號墳) 청룡도 평남 중화군 동두면 진파리에 있는 벽화고분.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것이라고 전해지는 왕릉의 주위에 분포한 14기 고분군 중의 하나이다. 1941년 5월 이 고분군에서 1호분과 4호분이 발굴되었으며, 특히 1호분은 벽화가 생생히 남아 있어서 학계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1호분은 높이 약 8 m, 지름 약 25 m의 규모이며 무덤방(묘실)은 동서 2.5 m, 남북 2.3 m의 사각형이다. 무덤의 형태는 앞방(전실)이 없는 외방무덤(단실묘)이며 벽화는 네벽과 천 정에 그려져 있다. 네벽의 벽화에는 사신도를 그렸으며, 모두 비운(飛雲), 비화(飛花), 나무 등으로 채워져 있다. 천정에는 벽과 마찬가지로 비운, 당초문 등이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다. 천정 가운데에는 해와 달의 화염을 묘사하는 둥근 원이 있고, 각각의 원 안에는 태양을 상 징하는 삼족오(三足烏), 달을 상징하는 두꺼비가 묘사되어 있다. 천정의 4귀퉁이에는 연화무늬가 있다. 이 벽화의 화풍은 휘감는 듯한 구름, 나무 등의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대체로 중국의 육조(六朝)시대 화풍과 비슷한 점이 보인다. 또한 연화무늬는 꽃잎 주변이 담채되고 가운데에 점이 하나 찍힌 것으로, 부여 능산리 벽화고분에서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의 벽화고분과는 달리 벽화상에서 여러 새로운 점을 찾을 수 있으며, 중국 육조시대와 부여 능산리 고분과의 관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고구려 후기(550년~668년)에만 들어진 벽화라고 볼 수 있다.
===============================
진파리 1호분(眞坡里 1號墳)
진파리 1호분은 6세기 후반, 귀족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고분의 위치는 평양시 역포구역(구 진파리)이다. 무덤칸 방향은 서쪽으로 치우친 남향이며, 무덤칸 축조 위치는 지상이다.
무덤 벽면과 천장에는 전면에 회죽을 곱게 바른 다음 그 위에 사신, 사람, 무늬 등을 그렸다. 연도에는 문지기를, 묘실 네 벽에는 구름 사이에 사신을 그렸다. 천장에는 벽과 마찬가지로 비운, 당초문 등이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다. 천정 가운데에는 해와 달의 화염을 묘사하는 둥근 원이 있고, 각각의 원 안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삼족오(三足烏), 달을 상징하는 두꺼비가 묘사되어 있다. 다른 고분들과 달리 청룡과 백호의 방향은 안벽 방향인 북향이며, 현무는 동향이다.
왼벽의 청룡은 앞으로 내디딘 오른쪽 앞발과 뒤로 뺀 왼쪽 다리, 어깻죽지의 띠모양 날개털, 빠르게 흐르는 구름 모양등으로 힘있게 하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여전히 꼬리는 계단형으로 묘사되어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꼬리 위에는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다.
오른쪽에 그려진 백호는 앞가슴을 힘있게 내밀고 앞발로 땅을 박차며 내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어깻죽지에서는 불꽃 모양의 날개털들이 여러 갈래 뻗어 나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머리는 표범류에 가까우며 몸 무늬는 표범류가 지닌 원점무늬이다.
앞벽 암수 주작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꼬리는 위로 쭉 뻗어 있어 금방 날아오르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왼쪽 벽의 주작은 자연계의 닭을 연상시키는 벼슬을 달고 있고 오른쪽 주작은 아열대 지방의 극락조와 같은 참빗모양의 머리 깃을 달고 있다.
묘실의 안벽에는 중앙에 현무를 그리고 좌우에 소나무를 배치하였다. 뱀은 거북의 몸을 두 번 감고 다시 거북의 긴 목을 감고 자신이 목을 역 S자형으로 틀면서 거북이 머리를 마주보고 있다. 거북이 머리와 뱀의 머리는 도마뱀처럼 보인다. |
|
Jinpha-ri Tomb No. 4 (진파리 4호분, 眞坡里 4號墳) |
|
개 요 |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고분은 진파리 고분군의 제일 북쪽 경사진 곳에 위치
6세기 전반기에 만든 고구려 귀족의 무덤
|
|
구 조 |
봉분의 동서 너비는 23m,앞면에서의 높이는 약 6m
연도와 묘실로 이루어진 단실분, 천장은 평행3각고임 형식
연도는 남쪽 중앙에 냈으며 길이는 3.15m
묘실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고 동서 2.53m 이며, 남북은 3.04m, 높이는 2.5m.
묘실의 네 벽은 한 장의 판돌로 되었다. 큰 판돌을 매끈하게 다듬어 낸 기술이 경이
롭다.
|
|
벽 화 |
연도와 묘실에는 판돌 위에 회죽을 바르고 그 위에 인물풍속도 및 사신을 주제로 벽화를 그렸다.
묘실의 네 벽에는 사신과 신선·구름무늬·연꽃무늬를, 천장에는 별과 덩굴무늬·연꽃무늬·병풍무늬· 물레무늬 등을 그렸으며, 연도벽면에는 연못그림을 그렸다.
연도와 묘실에는 판돌 위에 회죽을 바르고 그 위에 인물풍속 및 사신을 주제로 벽화를 그렸다.
묘실의 네 벽에는 사신과 신선·구름무늬·연꽃무늬를, 천장에는 별과 덩굴무늬·연꽃무늬·병풍무늬·물레무늬 등을 그렸으며, 연도벽면에는 연못그림을 그렸다
|

| ▶ 군데 군데 회칠이 떨어져내린 진파리 1호분 안칸 동벽의 청룡 사신도. | |
사신도, 마왕퇴 무덤 ( + 진파리, 덕화리 고분의 천장대연화문) - 2010.6.9 #2
北 '진파리 1호분' 국내 언론에 첫 공개
게재일 : 2004년 06월 21일 [1면] 글자수 : 463자
기고자 : 평양=글 정재숙, 사진 조용철 기자
북측이 1974년 발굴을 끝낸 이래 답사를 엄격히 제한하던 '진파리 1호분'을 30년 만에 국내 언론에 공개했다. 입구의 돌문과 벽돌을 들어내자 사신(四神)과 풍경화가 조화를 이룬 벽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암수 주작(朱雀·붉은 봉황)이 푸드덕 날개를 펴 1500년 세월을 뛰어넘는 듯하다.
중앙일보 취재단은 MBC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두루 취재했다. '덕흥리 벽화고분''강서대묘''강서중묘''진파리 1호분'을 답사했고 중앙역사박물관과 대성산성·동명왕릉에도 다녀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8일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북한·중국이 각각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고구려 유적을 놓고 심사 작업을 한다.
평양=글 정재숙, 사진 조용철 기자 johanal@joongang.co.kr
[여기는 고구려] 上. 벽화, 고구려발 타임머신
중앙일보 / 2004년 6월 22 08:17 입력
1600년 전 조상 숨결 벽화에 생생히…
활 쏘고 수레 타고…청룡.백호 뛰어놀아
소나무 벽화에선 현대 그림 수법 엿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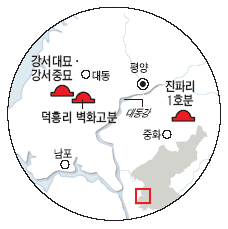 오는 28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북한이 고구려 벽화고분 일부를 중앙일보와 MBC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벽화고분은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 소재 세칭 '덕흥리고분'과 인근 삼묘리에 있는 '강서대묘''강서중묘', 그리고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 '진파리 1호분'등 네 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진파리 1호분'에 대해 북측이 한국 언론에 공개 및 사진촬영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8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북한이 고구려 벽화고분 일부를 중앙일보와 MBC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벽화고분은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 소재 세칭 '덕흥리고분'과 인근 삼묘리에 있는 '강서대묘''강서중묘', 그리고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 '진파리 1호분'등 네 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진파리 1호분'에 대해 북측이 한국 언론에 공개 및 사진촬영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고구려 벽화고분 중 이번에 공개된 것은 불과 네 곳밖에 안 되지만 벽화를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흥분과 감동이었다. 천년을 훌쩍 넘겼음에도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아! 고구려'에 취재진은 내내 입을 다물 수 없었다.
◆ 진파리 1호분=북측이 "발굴 이후 30년 만에 최초"라며 그동안 진흙과 벽돌로 봉쇄했던 입구를 뜯어내자 무덤 안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암냉(暗冷)과 함께 고구려 조상들의 숨결이 후-욱 온 몸에 느껴졌다. 촬영용 조명을 타고 맨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무덤 안길의 동.서벽에 각각 자리잡은 문지기. 발견 당시 도굴 구멍을 통해 진흙이 쏟아지면서 훼손돼 거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눈을 부릅뜬 채 두가닥 창을 들고 마주선 자세가 누구라도 주인에게 손 하나 까딱하면 그냥 두지않을 기상이다. 무덤칸 안으로 들어서니 여기저기서 물빛이 비치고 바닥엔 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벽화 부스러기들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 사방 벽과 천장에 희끗희끗 드러난 상처들의 딱지다. 벽면을 곱게 미장하고 회반죽을 입힌 뒤 그림을 그린 탓이다. 하지만 그래도 6세기의 이 걸작이 '폭삭 '하지 않고 오늘이 있음이 얼마나 고마우냐. 묘실이 남향이니 북벽이 주벽인데 사신총(四神塚)답게 현무(玄武)가 그려져 있다. 손상된 부분이 많아 현무의 모습 중 거북의 왼쪽 뒷다리와 등껍질 일부만 선명하게 보일 뿐 머리 부분과 거북을 휘감고 있는 뱀의 형상은 흔적만 보인다.
다른 사신도 무덤과 달리 현무를 가운데 두고 좌우 대칭적인 자리에 각각 소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는데 현대화 수법이 읽히는 자태가 자못 영험스럽다. 소나무와 현무 사이, 그리고 윗 부분 등에 바람에 날리는 구름무늬가 보는 이로 하여금 고구려 들판으로 내몰고, 오른쪽 소나무에는 거세게 휘날리는 구름을 타고 한마리 용이 승천하면서 복토(福土)임을 가리키고 있다.
동벽의 청룡, 서벽의 백호도 보존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나 늠름한 기상은 살아 있다. 특히 다른 무덤의 사신도와 달리 용호가 모두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게 특색인데 청룡의 꼬리 위쪽에 그려진 한마리의 나는 새가 매우 생동감을 준다. 남벽 입구 좌우의 주작도 그런 대로 날렵하고 천장의 해(동쪽)와 달(서쪽)엔 각각 삼족오(三足烏)와 옥토끼.두꺼비가 전설을 일러주고 있다.
◆ 덕흥리 벽화고분=잘 알려진 대로 지금까지 발견된 90여기의 벽화고분 가운데 안악3호분과 함께 고구려의 문화와 생활풍속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보물창고다. 특히 벽화에 있는 묵서(墨書) 묘지명(墓地銘)을 통해 무덤 축조 및 벽화를 그린 시기를 알 수 있어 벽화고분의 연대 가르기 기준이 되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1976년 인근 옥수수 밭 등에 물을 대기 위한 물탱크를 만들려다 우연히 발견된 이 무덤은 당시 봉분도 없는 상태로 도굴꾼에 의해 천장 뚜껑이 열려 있던 탓에 무덤 안이 온통 진흙과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북측 관계자의 설명에다 이미 중앙역사박물관에 전시된 모사도(발굴 당시 제작)를 본 터라 답사라야 그저 실물을 직접 본다는 의미 정도로만 생각했다. 30년이 다 돼가는 마당에 더 망가졌으리란 막연한 생각에서. 하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선 순간 확인되는 생각의 얄팍함이라니…. 묘지명에 따르면 영락(永樂) 18년(서기 408년)에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 이듬해 묘실의 문을 닫았으니 거의 16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오히려 모사도는 물론 사진보다도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림, 그림들. 현대과학으로도 아직까지 안료의 정확한 성분조차 분석해 내지 못하는 판에 조상들의 지혜를 한 순간이나마 가볍게 본 듯해 얼굴이 화끈거린다. 외부의 빛과 바람의 직접 접촉을 막기 위해 지하로 'ㄷ '자 모양으로 돌림한 통로를 따라 들어가니 앞칸 북벽에 휘장을 친 평상 위에 앉은 주인공 유주자사(幽州刺史) 진(鎭)이 근엄한 표정으로 후손을 맞는다. 보호유리벽을 통해서지만 좌우에 시종을 거느리고 서벽에 그려진 13명의 태수에게서 하례 받는 장면이 생생하다. 태수들 중 밑에 그려진 일부의 모습이 크게 훼손됐지만 주인공과 나머지 인물은 얼굴과 수염 등의 선이 방금 그린 듯 선명하다. 주인공 오른쪽 위 천장 부분에 쓰인 묘지명도 대부분 읽을 수 있고, 북두칠성과 견우직녀의 만남도 그럴싸하다. 안칸과 연결된 통로 동벽엔 주인공 부인의 수레를 끌고가는 황소의 콧김이 느껴지고, 안칸 서벽에선 2인1조의 마상 활쏘기 대회가 한창이다. 앞칸과 안칸, 사이 길의 벽과 천장 어디를 둘러봐도 그림이 살아 움직인다. 행렬.사냥.연못.마구간.창고.은하수.나무.말 등등. 생전의 생활풍속과 천상세계가 파노라마를 이루고 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고구려에 와 있는 기분이다. 몇번을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질리지 않는다. 고구려의 위대함이자 힘이다.
◆ 강서대묘.중묘=세 무덤 중 대묘와 중묘에만 사신도(四神圖)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대묘는 규모나 천장에 황룡이 있는 점으로 미뤄 590년에 사망한 평원왕의 무덤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묘는 그의 아들 양원왕일 것으로 추정된다. 두 무덤 모두 벽면에 장식무늬 없이 사신도만 그려진 것이 특색이다. 질이 좋은 화강암을 잘 갈아서 무덤칸을 만들고 그 위에 벽화를 직접 그린 것도 공통점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대묘의 청룡과 중묘의 백호. 그동안 여러차례 사진을 보았지만 막상 대묘의 청룡을 보니 눈을 크게 부릅뜨고 아가리를 벌린 채 대지를 박차고 곧장 승천할 듯한 위풍당당함에 절로 뒷걸음 쳐진다. 몸뚱이 비늘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칠한 오색(五色)이 선연하고, 짜인 구도와 속도감 있는 필치가 웅건하며 호탕하기 그지없다. 중묘의 백호 역시 둥글고 큰 눈에다 넓고 큰 머리로 남쪽으로 내닫는 날렵한 기상이 기운생동 그 자체다. 두 무덤 모두 청룡과 백호가 강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무와 주작은 신비롭고 유연한 편이나 짜임새나 질감 등은 살아 있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 천장의 그림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묘에 그려진 비천(飛天)의 경우 선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연보랏빛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피리를 불고 날고 있는데, 피리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바람결이 느껴진다. 흔적만 남아 있는 대묘의 백호도 전체적인 회화수준으로 보아 걸작이었음에 틀림없을진대 일제가 안료 연구를 한답시고 긁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게 북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탄스러울 뿐이다.
평양=이만훈 전문기자

▶ 소수레 타고 납시오. 북한 국보 유적 제156호인 덕흥리 벽화무덤은 인물 풍속도를 그린 '유주자사' 진의 두방무덤이다. 앞칸과 안칸의 사이 길 동벽 윗단을 수놓은 벽화는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나들이 나선 무덤 주인과 남녀 시종을 묘사하고 있다. 색동 주름치마에 긴 저고리를 입고 마차 뒤를 따르는 여성들이 눈길을 끈다. 평양=조용철 기자

▶ 강서대묘 청룡. 북한 국보 유적 제28호인 강서큰무덤은 안칸 북벽의 현무 등 네 면을 장식한 사신도로 유명하다. 안칸 동벽에 그려진 청룡의 살아 꿈틀거리는 듯 날아오르는 모습이 고구려인의 기상을 짐작하게 한다.

▶ 문 여는 진파리 1호분. 1974년 발굴 작업을 끝낸 뒤 진흙으로 봉한 채 엄격하게 출입을 제한해 온 진파리 1호 무덤이 30년 만에 한국 언론에 문을 열었다.

▶ 한국 그림 속 첫 소나무. 진파리 1호분 안칸 북벽에 솟아난 소나무는 배경이 아닌 풍경 그 자체로 독립한 한국 회화사 속의 첫 나무로 기록할 만하다.

▶ 연꽃 무늬 천장. 두둥실 하늘로 떠가듯 역동적인 구름 무늬와 아름다운 연꽃 문양에 취한 한국 취재단이 진파리 1호분을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에서 둘째,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가 최종택 고려대 교수.
2004.06.21 17:27 입력 / 2004.06.22 08:17 수정
[여기는 고구려] 上. "화공이 조금 전에 붓을 거두고 나간 듯"
중앙일보 / 2004년 6월 22일 08:18 입력
최종택 고려대 교수 고고미술사학
"정말 감동적입니다." 덕흥리 벽화고분에 들어선 필자에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답한 첫 마디다. 그 많은 미사여구가 생각조차 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한동안 눈앞이 캄캄했다. 조명을 받아 조금씩 드러나는 벽화는 너무나 생생했다. 벽화를 그리던 화공이 조금 전에 붓을 거두고 나간 듯 필선이 선명했다. 평상 위에 앉아 있던 벽화의 주인공이 금방이라도 일어서 걸어 나올 것만 같았다. 두차례의 도굴을 당하고도 1600여년을 견뎌 온 벽화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감동은 강서대묘와 강서중묘, 진파리 1호분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감동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벽화의 보존대책이 너무나 허술했다. 덕흥리고분은 공기차단용 문이 5개나 달린 진입로를 설치하고, 벽화는 유리로 보호했으나 근본적인 보존대책은 아니었다. 강서대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진파리 1호분의 경우는 곳곳의 석회와 벽화가 떨어져 나갔으며, 누수로 인해 작은 석회 종유석이 생기기도 했다. '원래 상태로 묻어두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관계자의 말이 실감나게 들렸다.
지난해 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에서 보류된 주된 이유가 접근성 및 보존 문제였다고 한다.
몇차례의 평양 방문을 통해 만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미루어 북한 당국은 지금보다 더 좋은 보존대책을 세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남북 공동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취재여행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제의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꺼리던 북한이 처음으로 남한 취재진에 고분벽화와 고구려 유적.유물을 공개한 것이다. 취재 중 북한의 전문가들과 공동의 연구.보존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벽화의 보존과 연구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남북의 공동 대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4.06.21 17:27 입력 / 2004.06.22 08:18 수정
진파리 고분과 평강공주묘
[1부] 5. 진파리 고분과 평강공주묘
|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묘. 남한에서는 진파리 제4호분으로 알려진 이 무덤 내부에는 소나무가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가 있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묘. 남한에서는 진파리 제4호분으로 알려진 이 무덤 내부에는 소나무가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가 있다.
|
동명왕릉 주위의 산 언덕엔 20여개의 고구려 무덤들이 산재해 있다. 미술사에선 여기를 진파리 (眞坡里) 무덤떼 (古墳群) 라 부른다. 모두 돌칸흙무덤이며 안길 (羨道) 과 안칸 (玄室) 으로 이뤄진 외칸무덤 (單室墓) 이다.
시기적으로는 평양으로 천도한 5세기초부터 6세기에 걸쳐 있다. 그중 진파리 고분의 명성을 드날리게 해준 것은 제1호분과 4호분의 벽화다. 진파리 고분벽화에는 참으로 특이하게도 소나무 그림이 아주 서정적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제1호분 북쪽 벽에 그려져 있는 한쌍의 소나무는 그 자태가 대단히 어여쁘고 늠름한데 하늘에는 아름다운 인동 (忍冬) 당초가 바람결에 흩날리고 있어 더욱 환상적이다.
한마디로 고구려 고분벽화, 아니 한국미술사에 빛나는 한폭의 명화다. 그래서 진파리 고분을 답사한다는 것은 비록 지금은 밀폐돼 벽화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명작의 현장에 가 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의의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지금 진파리 언덕에 오르니 진파리 고분벽화에 나오는 소나무처럼 멋진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발견된 85개의 고구려 고분벽화 중 유독 진파리 고분에만 소나무 그림이 있는 것을 우연으로 돌리기엔 너무도 인연이 깊어 보인다.
동명왕릉과 진파리 고분을 안내해 준 이는 리명화 강사였다. 강사는 안내원보다 직급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리명화 강사는 내가 답사길에 만난 10여명의 안내원 중 가장 학식이 깊어 보였다. 나이는 28세에, 세대주 (북한에선 남편을 이렇게 부른다) 는 의사라고 했다.
나는 진파리 솔숲과 한 몸이 되고 싶어 콧바람 소리까지 내며 있는대로 깊이 숨을 들이켜보고, 떨어진 솔잎을 밟는 감촉이 더없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오솔길을 걸으면서 안내 강사의 얘기를 들었다.
옛날에 이 언덕엔 소나무가 더 우거졌는데 고을 관리가 잘못해 산불을 냈다는 것이다. 화가 난 평안감사는 이 관리에게 멀리 제주도까지 가 소나무를 옮겨다 심어놓으라는 벌을 내려 일부러 제주도 소나무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 솔밭엔 해송 (海松) 이 가득하다는 설명이다. 그러고 보니 평해 월송정이나 강릉 경포대에서 보던 그런 소나무들이었다. 나는 얘기를 들은 값으로 정겹게 말을 당겨 보았더니 그 대답이 더욱 그윽했다.
"명화동문 그 말을 믿으세요?"
"얘기가 재미있고 교육적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벌방지대 (저지대) 엔 해송이 잘 된답니다."
"야! 그 해석이 더욱 멋있습니다. 명화동문 최고가는 강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입바른 칭찬을 하자 안내강사는 순발력 있게 받아친다.
"앞놓고 평가하는 걸 뭐라 못하겠는가."
사람 앞에 놓고 칭찬하는 걸 무슨 칭찬인들 못 하겠느냐는 말이다. 북한에 와 내가 놀란 사실 하나는 이곳 여성들의 유머 감각이었다. 농담하는 말재간이 보통이 아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농을 던져도 화내거나 앵돌아지는 일 없이 이렇게 여유있게 넘긴다.
안내강사가 스무개의 무덤 중 어느 쪽으로 가고 싶냐고 묻기에 우선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제4호분으로 먼저 가자고 했다. 멀리 있을 줄 알고 1호보다 4호를 가리켰는데 저 동쪽 끝이 1호분이고 4호분은 요 모서리 돌아 있단다. 아담한 크기의 제4호분은 아침 햇살을 받아 무덤무지가 말갛게 빛나면서 따뜻한 정감마저 느껴졌다. 그런데 제4호분은 놀랍게도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무덤이라고 안내판에 쓰여 있었다.
이 아름다운 벽화무덤이 아름답게 살다간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무덤이라는 것이 반가웠다. 나는 온달 얘기는 시덥지 않은 옛날얘기로만 알고 있다가 시덥지 않은 바보 온달 이야기의 주인공은 온달이 아니라 평강공주라는 호암 문일평 선생의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이야기는 바보 남편에 장님 시어머니를 모신 지극한 사랑,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믿음의 사회,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인간적 성실성,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애국심, 그리고 처연히 저 세상으로 떠나는 대범한 죽음의 관념, 거기에다 최고의 지배층과 최하의 평민이 만나는 사회적 일체감을 다른 사람 아닌 평강공주를 통해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요즘 영국인이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사모하듯 평강공주를 기렸다는 얘기였다.
그런 생각에 젖어 평강공주 무덤을 좀처럼 떠나지 못하는데 안내강사는 진파리 고분떼 중에서 내부가 공개되고 있는 것은 7호분밖에 없으니 우선 그걸 보러가자며 나를 그쪽으로 안내했다. 아마도 내부에 들어가면 놀랄 것이라며 은근히 기대감을 주기도 했는데, 나는 속으로 '벽화고분이 아닌걸 내가 다 아는데 뭐 놀랄 게 있을라고' 하면서도 뭔가 기대되는 바도 없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파리 제7호분은 미술사에서 왕관 장식이 출토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제까지 알려진 유일한 고구려 왕관인 이 금동관은 태양을 상징하는 세발 까마귀 (三足烏) 와 힘있게 뻗친 불꽃무늬를 조각해 남한의 미술사 책에는 '금동투각일상문 (金銅透刻日像文)' 장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아주 쉽게 '해뚫음무늬 금동장식'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7호분은 사방 3.5m의 좁은 안칸으로 짜인 외칸무덤이다. 그러나 안칸에 들어서니 안내강사의 예견대로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다. 천장이 시원스럽다 못해 통쾌할 정도로 높이 뚫려 있는 것이었다. 바닥에서부터 무려 6.6m나 됐다.
반듯한 장대석 (長大石) 을 여섯 단으로 좁혀 들어가다가 말각조정 (抹角操井) 법으로 천장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천장은 가운데로 빨려 올라가듯 높고 길게 느껴졌다. 그 구성은 건축학적으로 대단히 견고하게, 미학적으로는 대단히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서려 있는 것이었다.
금동관이 나올 만한 귀티가 보였다. 돌들은 이가 꼭 맞게 축조됐고 이음새마다 회를 곱게 칠했다. 솜씨가 훌륭한 것이었을까, 정성이 지극했던 것일까. 나는 넋을 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나갈 줄 모르고 맴을 돌고 있으려니 안내강사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는 듯 해설을 시작한다.
"반듯한 돌로 무덤칸을 쌓고 그 위에 석회를 제창 매끈하게 발라 곱게 마감했습니다. 천장은 여섯 단으로 평행고임을 해 올라가다가 두 단의 삼각고임을 얹어 매우 높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미술사 용어였다. 나는 차라리 내가 미술사가를 자처하지 말 것을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여러가지로 안내강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었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나는 선물로 준비해온 스타킹 하나를 꺼내 안내강사에게 건네주었다.
"명화동무, 고맙습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서울서 올 때 스타킹 하나 사왔는데 받아주십시오."
"스타킹이라뇨?"
안내강사는 부끄러운 듯 선물을 받아쥐고 가만히 포장지를 들춰보고는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 살양말이군요."
*****만장일치*****
[밝은 앞날][꿈은 이루어진다][꿈은 미래의 현실이다]

백두산 천지
[ 과거와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존재한다.]
------------------------------------------
만주(滿洲)
압록강 북쪽을 만주라 하죠.
만주는 수천년전 상당히 오랜세월 한민족의 중심지였고
[발해]시대까지는 확실한 한민족의 영역이었으며
그 후 주로 야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중국이 [청나라]시대가 되면서 중국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땅이 만주죠.
- 중국이 만주를 중국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길어봐야 불과 몇백년.
우리 한국인들이 아련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곳, 만주.
- 물론 무슨 무력으로 만주를 회복하여야한다든지 하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모든 일은 평화적으로 옳바르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장일치(滿場一致)
만장일치(滿場一致)라는 말은 만장(滿場)
에서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여 일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별 들리는 바 없다 하겠는데
한국에서는 이 만장일치제도의 풍습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신라 건국시기부터 이미 있었다는 만장일치제도인 화백(和白)제도는 유명한데
고조선의 풍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고구려에서도 수상(최고 관직) 대대로(大對盧)를 국왕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모여서 선출하였고
백제에서도 수상 상좌평(上佐平)을 투표로 선출했다는 정사암(政事巖)의 고사(故事)가 전해지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고조선으로부터 전해오는 만장일치(滿場一致)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만장(滿場)이란 무엇인가.
------------------------------------------
[ 만(滿) - 전서 ]








[출처 - http://www.internationalscientific.org/CharacterASP/]
-----------------------------------------------------------
위는 만(滿)의
고대형들인데




이러한 형상들에는
[삼족오(三足烏 : 세발 검은새)]가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리가 3개인 새를 표현하려한 그림.
이러한 삼족오 형상이
o
이러한 [원] 즉 태양(해) 안에 들어있는 형상이라 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태양(해) 안에 [3발 검은새]가 들어있는 형상이라 하겠습니다.

평양 진파리고분 출토 해뚫음무늬 금동장식
위 고구려 유물 중앙에도 태양(해) 안에 있는 [삼족오]가 있죠.

만(滿)이라는 말이 한민족의 중심지를 나타내는 말 중 하나이니
그 고대형에 [삼족오] 형상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겠으며
그래서 고구려도 [삼족오]를 상징형상으로 쓴 것이죠.
만장(滿場)의 장(場)
-------------------------
[ 장(場) - 갑골문 ]



마당 장(場)의 갑골문은 위처럼 井 또는 田 형상입니다.
돌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형상이라 하겠는데
장(場)에 대한 [설문해자]의 해설이 의미심장합니다.
---------------------------------
장(場)은 신도(神道)에 제사(祭)를 지내는 것이다.
[ 場(장) - 祭神道也(제신도야) ]
-----------------------------------
신도(神道)
삼국유사에 [환웅(桓雄)임금]은 신웅(神雄)으로도 존칭되죠.
쉽게말해서 [신웅(神雄)의 도(道)]를 [신도(神道)]라 할 수 있고
일본의 신도(神道) 역시 한국의 신도(神道)가 전해져서 일본인들이 그러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 물론 한국의 오리지날 [신도(神道)]를 흉내도 제대로 못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대략 위와 같은 [고대한국 3연성 천제단(피라미드)]이 바로
신도(神道)에서 제사(祭)를 지내는 [장소]라 하겠는데
장(場)이라는 글자가 원래는 아무런 장소나 뜻하는 글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장소]를 뜻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장(場)의 갑골문이 井 또는 田 형상
즉 돌피라미드 형상인 것이 이해가 간다 하겠습니다.
[신도(神道)에서 제사(祭)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돌피라미드이니 말이죠.
고대한국 3연성 피라미드란 무엇인가 (간략정리) <- 관련글
--------------------------------------------------
[ 만(滿) - 전서 ]


위처럼 만(滿)의 전서에도 역시 井 또는 田 형상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 하겠습니다.
---------------------------------
[ 장(場) - 전서 ]

이처럼 장(場)의 고대형에도 만(滿)의 고대형처럼
[삼족오]를 연상시키는 형상이 나오며

이러한 형상도 나오죠.
---------------------------------------
[ 조(朝) - 금문(金文) ]

위는 (고)조선(朝鮮)의 [조(朝)]의 고대한자(금문)인데
원래 [조(朝)]자는 (고)조선(朝鮮)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이고

이러한 형상은 고조선의 [대표상징]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태산(太山)의 비밀 <- 관련글
[설문해자]에도 장(場)이 祭神道(제신도)
즉 신도(神道)에서 제사(祭)를 지내는 형상이라 하였으니
장(場)이라는 글자에
신도(神道)의 나라인 고조선의 상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
그러므로 만장(滿場)이란
[삼족오(三足烏)]로 대표되고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한민족의 중심지이고
그곳의 사람들은 평소 화합이 잘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여 어떤 일을 결정하는 풍습이 있었고
만장일치(滿場一致)란 고대한국의 그러한 풍습을 표현한 말이며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도 한국선조의 그러한 훌륭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일제강점기 [3.1 운동] 때에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금모으기]에 나서고
2002년 월드컵 때에도 수백만명이 거리로 나와 함께 어울려서 응원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는 등의 모습이
고대한국에서 만장일치(滿場一致)를 할 수 있었던 강한 화합(和合)의 마음이 한국인에 피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단결이 잘되는 나라 <- 관련글
감사합니다.
17호-진파리 고구려 고분 떼 (진파리고구려고분군)

진파리 1호무덤 외경
평양 동남쪽에 있는 제령산의 서쪽 줄기들에는 고구려 돌 흙 칸 무덤들이 여러 곳에 떼를 짓고 있다. 이곳의 무덤 떼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진파리 무덤 떼인데 그것은 동명왕릉이 자리잡은 구릉의 뒤쪽에 있다.
그 중 1호 무덤은 동쪽에서부터 첫 번째 것으로 사신도를 그린 외칸 무덤이다. 이 무덤 안칸의 네 벽에는 채색구름과 꽃 보라 속에 청룡, 백호, 현무, 주작 등 사신을 그렸고, 천장에는 해, 달, 구름무늬, 연꽃무늬와 여러가지 넝쿨무늬를 그렸다.
4호 무덤은 무덤떼의 동쪽에서부터 네 번째의 것으로 인물풍속 및 사신도를 그린 외칸무덤으로 평원왕의 공주와 그의 남편인 온달장군의 합장묘로 추정되고 있다.
진파리 1호분은 평양시 역포구역에 위치한 고분으로서 6세기 후반 귀족의 무덤으로 추정 된다. 이 그림은 진파리 1호분의 유명한 소나무 그림인데, 심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소나무는,당시 고구려인들의 기상을 잘 나타낸다.굵은 선과 가는 선을 잘 배합해 가면서 푸른 하늘에 높이 솟은 소나무를 실감나게 표현한 그림이다.
(북한 고구려 유물 특별전때 이걸 본적있습니다. 상당히 멋있는 벽화죠)
진파리 4호분은 1호분과 비슷한 시기의 무덤으로서 이 무덤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뒤섞 인 종교적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고분은 전반기의 고분 벽화에서 볼 수 있었던 제한된 생활 장면들 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그림은 묘실 벽면의 화려한 연꽃무늬의 모습이다.

고구려 고분벽화 금박 사용 첫 확인
온달·평강공주 묘 추정 진파리 4호분서
|
남경욱기자
| |
|
 |
| 진파리 4호분의 금박 꽃 문양. | | |
 |
| 꽃 문양의 세부사진. 국립문화재연구소 제공 | | |
| 고구려 고분 벽화에 채색 안료로 금박이 사용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5일 북한 평양시 력포구역 용산리의 동명왕릉지구에 있는 진파리 1호분과 4호분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파리 4호분에서 연도(널길)의 양벽과 현실의 천장 부분 등에서 금박을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와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지난해 5월30일~6월9일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와 함께 훼손이 심한 진파리 1ㆍ4호분의 보존작업을 벌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06년 첫 조사에서 진파리 4호분 연도 동쪽 벽에서 금색이 눈에 띄어 현장에서 비파괴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광석의 일종인 ‘웅황’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금색 흔적을 선별해 휴대용 형광 X선 분석기로 분석한 결과 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구려 고분 63기 가운데 16기에 벽화가 있으며, 문화재연구소는 이 가운데 지금까지 10기를 조사했으나 금박을 사용한 흔적을 확인한 것은 진파리 4호분이 처음이다.
금박은 현실 안 천장 벽화에 별자리를 표시하거나 천장 받침의 문양대에서 금꽃을 강조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됐는데 심하게 긁혀 남아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상태였다. 일제시대 당시 고분이 열린 채로 방치됐을 때 사람들이 긁어냈을 것이라는 게 북측 관계자들의 추정이다.
연구소는 “금박의 가장자리가 칼로 잘린 듯 날카로운 직선인 점으로 미뤄 금박을 붙이기 전에 금박을 종이와 같은 바탕에 붙여 원하는 모양으로 오려내 붙인 후 바탕재를 벗겨내는 작업을 반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순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사는 “진파리 4호분에서 사용된 금박은 연꽃 문양과 소나무 가지 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됐다“면서 “이는 고구려의 금 세공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이 고분에 매장된 인물이 권력이 있는 왕족 또는 귀족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고분의 격이 한층 올라가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역사적 사료는 없지만 북측에서는 진파리 4호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합장묘로 추정하기도 한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진파리 1ㆍ4호분의 손상 상태를 여러 과학 장비를 통해 정밀하게 확인했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손상도면을 제작해 고구려 벽화고분의 보존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장산 깃대종 ㅡ 비단벌레
1973년 신라 고분 중 가장 규모가 큰 경주 황남대총 발굴 때 일이다. 고고학자들은 금동 말안장 뒷가리개에서 영롱한 빛이 비치자 일손을 멈추었다. 실로 눈부셨다. 영롱한 빛은 다름아닌 비단
벌레 날개였다.
나중에
조사한 결과 이 장식품은 목심 2개를 접합한 뒤 백화수피(자작나무 또는 산벗나무 껍질) 2겹을 깔고 그 위에 세로 방향으로 비단벌레 날개를 촘촘히 깔아 붙인 것이었다. 그 위에 금동 맞새김판을 덮고 테두리를 감싸 못으로 고정시켰다. 이를 다시 복원해 보니 1000 마리 분의 비단벌레 날개가 필요했다.(KISTI의
과학향기)
비단벌레 날개는 신라시대 왕릉급
무덤인 황남대총 뿐 아니라 금관총에서 출토된 화살통, 발걸이, 허리띠 꾸미개 등의 유물에서도 발견됐다. 또 고구려 진파리 고분에서도 출토되었다.
이처럼 왕실에서 비단벌레 장식을 좋아한 것은 황금빛의 금동판과 비단벌레 특유의 화려한 초록빛 광택이 어울렸기 때문이다. 최상의 공예품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비단벌레는 '왕의 곤충'으로 불렸다. 더불어 비단벌레 장식을 옷 같은데 달고 다니면 증미(增媚·
성욕을 증가시킴), 미약(媚藥)이라 하여 선호했다.
이같은 비단벌레는 한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에 몰려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8년 천연
기념물 496호로 지정했다.
현재 비단벌레는 변산반도 내소사 일대와 해남 두륜산과 완도, 전남 백양사, 국립공원 내장산과 고창 선운산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장산의
깃대종으로 진노랑상사화와 함께 비단벌레를 지정했다. 깃대종은 특정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19개 지역에서 식물 18종과 동물 19종 등 37종을 깃대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리산은 히어리와 반달가슴곰, 설악산은 눈잣나무와 산양, 다도해해상은 풍란과 상괭이, 덕유산은 구상나무와 금강모치, 변산반도는 변산바람꽃과 부안종개 등이다.
때 마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와 (주)한국유용곤충연구소가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멸종위기 곤충 서식지 보호와 개선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단벌레와 같이 소중한 멸종 위기 곤충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으면 한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오피니언 |
|
| <한자와 함께하는 김덕영의 이야기 산책> 烏 (까마귀 오) |
|
| | |
|
|
|
|
|
|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마라 / 성낸 까마귀 흰 빛을 새올세라(시샘할세라) / 청강(淸江)에 죠히(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고려말 정몽주의 모친이 지었다는 백로가(白鷺歌)에서 보듯 까마귀에 대한 첫인상은 형편없었다.
우선 온통 검은 색인데, 제비나 흑두루미 같이 일부 검은 색조를 지닌 것도 있지만 까마귀한테서는 이들처럼 배나 날개 등 다른 부위에서 흰색으로 절묘한 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거나, 적어도 몸매로 받쳐주는(?) 아름다움을 찾아볼 데가 없다.
검디검은 무채색 옷을 걸친 까마귀는 저승과 죽음을 상징하는 새라고 한다면 이는 필자만의 생각일까? 소리는 또한 어떤가? 투박하기 이를 데 없이 그저 아는 노래 가락이라고는 ‘캬악 칵’하니, 이게 무슨 외마디 소리인고?
그런데 등산을 하다 까마귀를 만나게 되면서 점차 까마귀와 친해졌다. 아니, 등산로 주변에 까마귀가 자주 보이는 걸 보면 거꾸로 까마귀가 사람을 친근히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까마귀의 좋은 점이 하나둘 생각나기 시작했다.
첫째는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것에서 보듯 청정성이다. 깨끗한 지역에서만 노닐며 속진(俗塵)에 묻혀있는 아랫동네에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순수한 청정(淸淨)이미지는 환경문제가 화두인 21세기에 맞는 콘셉트 아닌가?
두 번째, 여러 색조가 아닌 검은 단색을 유지하는 점에서 정직하고 우직해 보인다. 검은 옷 하면 언젠가 아내가 머리부터 스타킹에 구두까지 온통 검정 일색으로 성장(盛裝)을 하고 외출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내가 ‘까마귀 패션인가?’하고 놀렸지만 검은색이 매우 어필한다는 것은 패션계에서는 일반상식이다.
‘까마귀 고기’는 옛말, 두뇌도 나쁘지 않다. 움막에 사람이 들어가면 까마귀는 가까이 가지 않고 사람이 나가야 비상경계령을 해제(?)하는데, 실험결과 넷 중 세 사람이 나가도 경계를 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숫자 넷까지는 기억을 하는 것 아닐까? 어떤 곳에서는 차도에 호두를 늘어놓고 차가 깨뜨리면 내려와 먹는 까마귀도 있다고 들었다.
나무에 앉을 때 까마귀 새끼는 어미보다 두 가지 아래에 앉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선조들은 효성이 지극하다는 표현으로 까마귀의 덕(?)을 기렸다 하는데, 이 역시 까마귀의 경계근무 중 하나일 성싶다.
야생의 생활은 늘 고단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의 연속이다. 경계초소는 어디에 있나? 시야가 트인 나뭇가지 위. 그러면 누가 경계를 담당하나? 노련하고, 자식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가 맡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
반포지효(反哺之孝)에 이르러서는 할 말이 없다. 어미가 늙으면 새끼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까마귀를 마땅히 존경해야 할 것이다.
본래 까마귀 오(烏)는 부수로 보면 새(鳥)가 아니라 불화(火) 또는 연화(灬) 부수에 속한다. 그러니까 삶는 팽(烹)이나 자(煮), 굽는 적(炙), 아니면 마음이 타는 초(焦) 등과 유사한 글자라는 말이다. 아마도 불에 까맣게 탔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는 새로도 통한다.
고구려 유물 중 태양 안에 세발까마귀(三足烏·삼족오)를 넣은 그림이 나타나는데, 각저총, 오회분, 덕화리 고분벽화나 진파리 무덤에서 나온 장식품에 보이고 선비족이나 흉노족 유물에도 ‘세발까마귀 태양’이 그려져 있다. 종합해 보면 고조선 문명권에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박은식 선생의 해석에 따르면 ‘세발까마귀 태양’은 ‘태양 3신’의 상징으로, 3神은 고조선의 환인(桓因), 환웅(桓雄), 단군(檀君)을 지칭한다. 당시 고조선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가호하는 신으로서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3신에게 제사하고 고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까마귀가 고대에서부터 숭상의 대상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동안 까마귀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온 자신을 탓할 밖에.
-김덕영 대전시 경제정책협력관
| |
고구려 고분벽화 ㅡ 붉은색 물감 : 주사와 철
쌍영총ㆍ진파리ㆍ수산리 고분 안료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도 붉은색을 내는 데 사용된 주성분은 황화수은(HgS)이 주성분인 광물질 주사(朱砂)와 철산화물(Fe2O3) 계열임이 확인됐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난 10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개최한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 국제세미나"에 발표된 고구려 고분벽화 안료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로 더욱 강하게 뒷받침되게 됐다.

북한 소재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을 위한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신탁기금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준희 담당관 등이 최근 현지에서 직접 채취해온 진파리와 수산리 고분 벽화 시료를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에서 분석한 결과 두 고분 적색안료는 각각 주사와 철산화물로 밝혀졌다.
진파리 고분 시료의 경우 백색은 탄산무수염광물의 일종인 방해석(方解石. CaCO3)일 것으로 추정됐으며 적색은 주사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리 고분 시료는 백색은 진파리 고분과 같은 방해석일 것으로 짐작됐으나 적색 안료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나 철(Fe)이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철산화물일 것으로 짐작됐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유혜선 박사는 이미 지난달 언론발표를 통해 공개한 쌍영총 고분벽화 중 기마인물상 안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했다.
알려진 대로 그림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납(Pb)이 확인되고 있는 백색 안료는 연백(염기성탄산납.2PbCO3ㆍPb(OH)2)이었고, 적색은 주사였다고 유 박사는 보고했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붉은 물감 원료가 주사와 철산화물의 두 가지 계통이라는 연구성과는 1980년대, 미국의 보존과학자인 존 윈터(John Winter)에 의해 제출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보강된 보존과학적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구려인들이 고분벽화를 제작할 때 사용한 물감, 적어도 적색과 백색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 물감의 원료는 비교적 분명하게 밝혀지게 됐다.
한편 최근에 확인 발굴된 밀양 고법리 고려말-조선초기 "박익" 벽화묘 출토 유물에 대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결과 목관은 옻칠을 한 소나무를 재료로 했으며, 목관 표면 범자 명문에 쓴 흰색 안료는 순은(純銀)으로 드러났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최근 현지 조사한 북한 소재 고구려 벽화고분 중 진파리 1호분의 백호(白虎). 보존상태는 생각보다 양호한 편이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문화/ 2006.5.7 (서울=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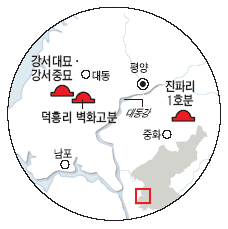 오는 28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북한이 고구려 벽화고분 일부를 중앙일보와 MBC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벽화고분은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 소재 세칭 '덕흥리고분'과 인근 삼묘리에 있는 '강서대묘''강서중묘', 그리고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 '진파리 1호분'등 네 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진파리 1호분'에 대해 북측이 한국 언론에 공개 및 사진촬영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8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북한이 고구려 벽화고분 일부를 중앙일보와 MBC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벽화고분은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 소재 세칭 '덕흥리고분'과 인근 삼묘리에 있는 '강서대묘''강서중묘', 그리고 평양시 역포구역 무진리 '진파리 1호분'등 네 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진파리 1호분'에 대해 북측이 한국 언론에 공개 및 사진촬영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묘. 남한에서는 진파리 제4호분으로 알려진 이 무덤 내부에는 소나무가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가 있다.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묘. 남한에서는 진파리 제4호분으로 알려진 이 무덤 내부에는 소나무가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