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3. 03:03ㆍ美學 이야기
[조정육의 숨은 그림 찾기] 꽃보다 책…산수도 속 선비가 선택한 것은
- 기자명 조정육 미술평론가
- 입력 2022.07.14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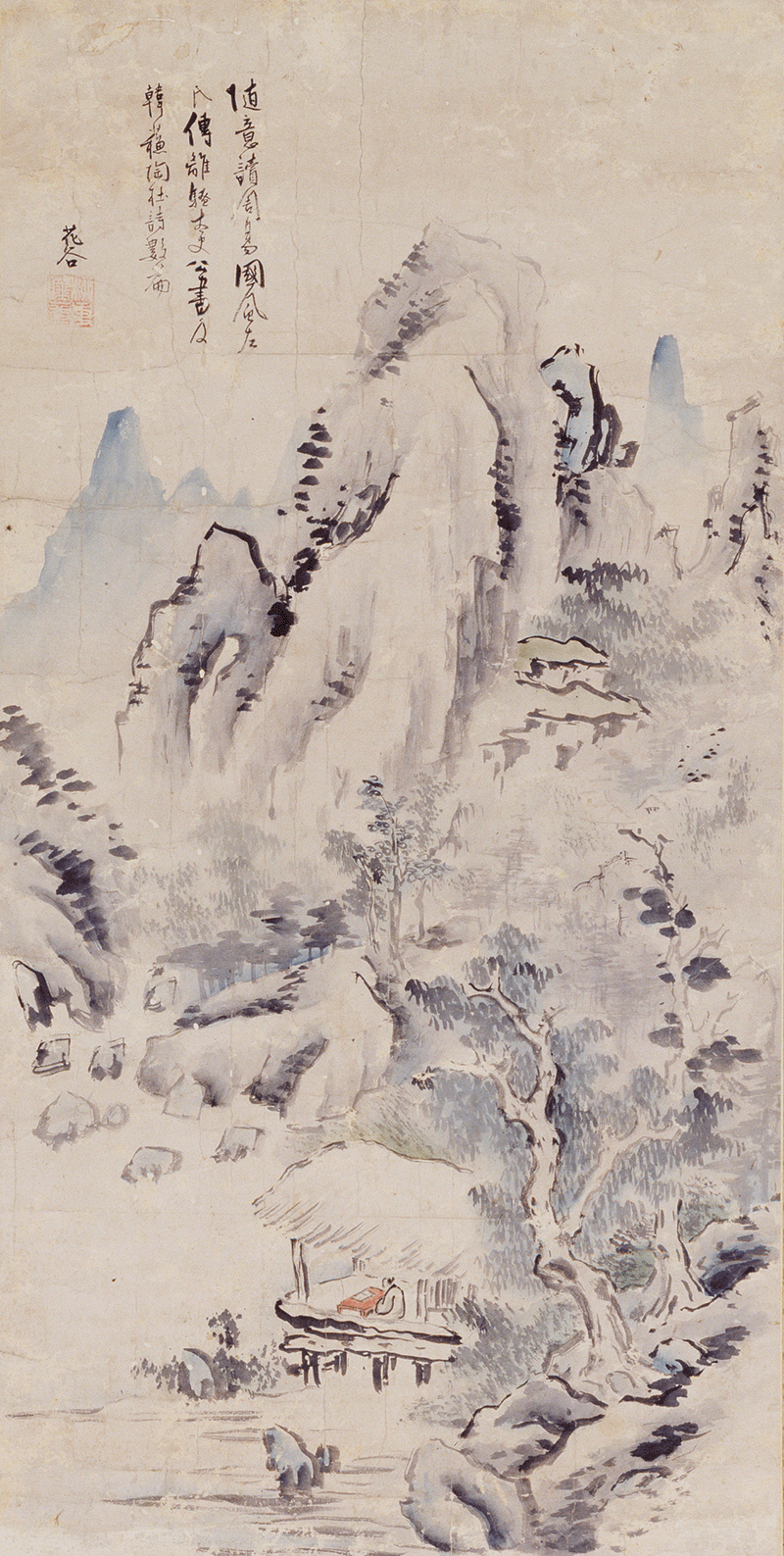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집 크기를 삼분의 일로 줄여서 가기 때문에 짐도 그만큼 줄여야 한다. 어떤 물건을 남기고 버려야 할지 고민의 시간이 길어졌다. 우선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버리기로 했다. 그 나머지를 선택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소유한 물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그 흔적들을 살펴보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건이 책과 꽃나무였다. 둘 다 가져갈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결국 꽃나무를 버리기로 했다. 이사 갈 집이 좁은 데다 베란다가 없어 화분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고사이트에서 열심히 화분을 팔고 있다. 안 팔리는 꽃은 나눔을 할 생각이다. 아직 두 달여의 시간이 남았으니 이사가기 전에는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이 들어서 규모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좁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30여년 동안 익숙해진 아파트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다.

무명씨라도 의미 있는 삶
꽃을 버리고 책을 선택하면서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꽃보다 책이라는 사실을. 넓은 집에서 하루종일 가드닝을 하며 행복해하던 때도 많았다. 그러면서 다짐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꽃나무를 키우면서 사는 여유를 갖겠다고. 그런 화분들을 전부 버려야 하고 책도 절반은 정리해야 한다. 나는 왜 꽃을 버리고 먼지 나는 책을 선택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꽃이 대신할 수 없는 책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런 고민 속에서 찾은 그림이 화곡(花谷)의 ‘산수도’이다.
가파르게 흐르던 계곡물이 깊은 산중을 빠져나와 잠시 한숨을 돌린다. 물이 머무는 곳에는 꽃이 피고 새가 날아오기 마련이다. 사람이 봐도 이만한 장소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멋진 풍경이다. 그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물가에 수각(水閣)을 세웠다. 수각은 물가에 세운 정자다. 수각의 나무 기둥이 물속에 발을 담근 채 서 있다. 한여름에 나의 발을 물속에 담가 첨벙거리는 것 같아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다. 그림은 산과 나무가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화면 뒤쪽으로 푸르스름하게 배치된 먼 산을 보니 이곳이 제법 깊은 산중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 제목을 ‘산수도’라고 붙인 듯하다. 그러나 이 그림은 단순한 산수도가 아니다.
왼쪽 상단 제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마음 가는 대로 ‘주역’ ‘국풍’ ‘좌씨전’ ‘이소’ ‘사기’ 그리고 한유(韓愈)와 소동파(蘇東坡)와 도연명(陶淵明)과 두보(杜甫)의 시 몇 편을 읽네.(隨意讀周易國風左氏傳離騷太史公書及韓蘇陶杜詩數篇)”
이 문장은 남송의 나대경(羅大經·1196 ~1242)이 지은 ‘산거(山居)’에 나온다. 원문에는 ‘도연명과 두보의 시, 한유와 소동파의 문장 몇 편을 읽네(陶杜詩韓蘇文數篇)’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에서는 그 순서를 바꾸어놓았다. ‘산거’는 산에 산다는 뜻이다. 산에 사는 사연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나대경이 제시한 사연은 김소월이 ‘산유화’에서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라고 읊었던 심정과 동일하다. 제시를 읽고서 ‘산수도’를 보면 비로소 수각 안에 앉은 선비가 눈에 들어온다. 이 그림은 산수를 보여주기 위해 그린 그림이 아니다. 정자 안의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다. 선비는 지금 물가의 정자에 앉아 서안(書案) 위의 책을 읽고 있다. 몸을 반듯하게 세우고 앉아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큰소리를 내어 책을 읽는다.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소리, 계곡물이 수각의 종아리에 부딪히는 소리에 낭랑하게 책 읽는 소리가 더해진다. 글 읽는 선비라면 누구라도 한번쯤 누리고 싶은 사치다.
그림은 가로보다 세로가 길다. 이런 형식은 6폭이나 8폭의 병풍으로 제작된 사례가 많다. 나대경의 시 일부를 적어놓은 것으로 봐서 ‘산수도’는 여러 폭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추측은 추측일 뿐 현재는 이 한 점만 남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나머지 작품들도 발견되기를 기대한다. 마루난간을 쓱쓱 그린 붓질이 워낙 거칠어서 지두화(指頭畵)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두화는 붓 대신 손가락, 손톱, 손바닥 등의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그린 그림을 뜻한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화가들이 나대경의 ‘산거’를 주제로 ‘산거도’를 그렸다. 정선, 심사정, 정수영, 김희겸, 이재관, 이인문, 오순, 김수철, 허련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김희겸과 이인문은 특히 많은 작품을 남겼다. 조규희는 ‘조선시대의 산거도’(1998)에서 나대경의 산거생활을 도해한 그림이 조선 후기에 유행하게 된 이유를 “은퇴한 관리가 수려한 산간 계곡에 별장이나 저택을 짓고 말년을 보내는 것이 유행”하였다고 분석하고, 그 장소를 그리게 함으로써 “조성자의 개인적 위신과 가세를 과시”하였기 때문에 초상화를 대신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인문의 ‘산거도’ 시리즈를 보면 주문자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별장의 규모가 화려하고 사치스럽다. 물론 ‘산거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벗어나 산속에 은거하며 자연을 벗삼아 독서하며 살고 싶은 선비의 마음속 바람을 담은 작품”일 수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산거도’가 유행처럼 제작되었는데 작가들은 그림 안에 제시와 서명을 남겨서 그들의 작품임을 확실하게 밝혔다.
그런데 ‘산수도’에는 제시만 있을 뿐 작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름 대신 적은 ‘화곡’은 ‘꽃의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름은 아니고 선비가 닉네임으로 쓰던 자(字)나 호(號)일 것이다. ‘화곡’이라는 닉네임을 쓴 인물은 산림(山林)에 머물고자 했던 은자(隱者)로 추정된다. 산림은 벼슬에 뜻을 두기보다는 산수간에서 독서하고 도를 강의하며 시를 읊는 등 한가로움을 추구하는 선비를 가리킨다. 화곡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화곡이라고 서명했지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기에 ‘무명씨’나 다름없다. 무명씨의 작품이니 연구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리 만무하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이 지금까지 소개된 적이 거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이트에는 이 작품 제목이 ‘산수도’라고 적혀 있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이 ‘산처치자’ ‘전다도’ ‘산가독서’ 등 나대경의 ‘산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목을 붙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주목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독서하는 자는 날마다 외우는 글이 있어야
그러나 동양의 ‘무명씨’는 영어의 ‘하찮은 사람(nobody)’이 아니다. 대단한 내공을 갖춘 숨은 실력자이나 그 신분을 감추고 사는 도사급에 가깝다. 그림 자체로 평가해야지 명함을 내밀지 않는다 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래서 화곡의 이 작품은 단순히 ‘산수도’라고 특징 없이 두루뭉술하게 부르지 말고 ‘산가독서도’라고 부르는 것이 이 숨은 고수에 대한 예의일 것 같다.
‘산수도’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 그런데도 전체 그림은 인물이 들어감으로써 활기를 얻는다. 그만큼 이 그림에서 독서하는 인물은 중요하다. 선비가 앉은 정자에는 책을 올려 둔 서안 외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다. 서안은 글을 읽거나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책상이다. 우리 시대가 그러하듯 조선시대에도 유행이란 것이 있었다. 당시의 독서인들 사이에 붉은색 서안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다. 화곡의 ‘산수도’에서의 서안이 붉은색인데 김희겸이 그린 ‘산가독서도’의 서안도 붉은색이다. 김희겸의 그림 속 인물이 화곡의 그림 속으로 순간이동한 듯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산가독서도’의 방 안에는 책꽂이와 찻잔 등의 소품이 더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한 물건을 소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았던 것 같다.
이런 소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다. 조선시대의 독서는 지금의 독서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조선시대의 독서는 학문 성취를 위한 최고의 공부였다. 그래서 사대부들은 독서인으로 불렸다. 독서의 기본은 읽는 것이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다. 그러나 독서는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외워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선 후기 성리학의 거두 송시열은 날마다 새벽이면 이불을 끼고 일어나 앉아 ‘맹자’ 몇 편과 ‘상서’ ‘서경’ ‘중용’ ‘대학’ 등을 외웠다고 전한다. 이것은 송시열이 일생 동안 힘써 한 공부로, 상을 당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한번은 제자가 송시열에게 “선생님께서는 ‘맹자’를 1000번 읽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송시열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맹자’를 1000번 읽었지만 첫 편과 둘째 편은 일생 동안 외운 것이니 몇천 번 읽었는지 모른다.” 1000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읽고 외웠다는 뜻이다. 송시열은 “독서하는 자는 반드시 날마다 외우는 글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근본이 서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주자가 생도들에게 “글을 읽을 때에는 정밀히, 그리고 익숙히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학문은 왜 하는가. 학문의 목표는 무엇이기에 평생 경전을 줄줄 외우며 근본을 세워야 하는가.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주제이니 다음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무튼 이사를 앞두고 심란해진 마음에 나도 ‘산수도’ 속의 선비처럼 책상 앞에 앉아 다시 ‘맹자’를 정밀하게 읽었다. 외울 수 있는 수준도 못 되고 한문 해독 능력도 달려 번역본을 눈으로 읽었지만 그 효과는 송시열의 독서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역시 꽃 대신 책을 선택하기를 잘한 것 같다.
출처 : 주간조선
'美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뻥 아냐?" 600년 전, 이 정도 ‘입체 그림’ 있었다고![후암동 미술관-마사초 편] (0) | 2022.10.09 |
|---|---|
| [조정육의 숨은 그림 찾기] 뜨거운 지구가 죽인 수컷 거북이들을 위해 (0) | 2022.09.13 |
| [ 조정육의 그림 속 시간여행 ] 우리, 차 한잔 할까요? (0) | 2022.09.13 |
| 한국화 / 나무위키 (0) | 2022.08.31 |
| 6월 관서정원답사 자료 6. 法隆寺五層木塔 - 2 (0) | 202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