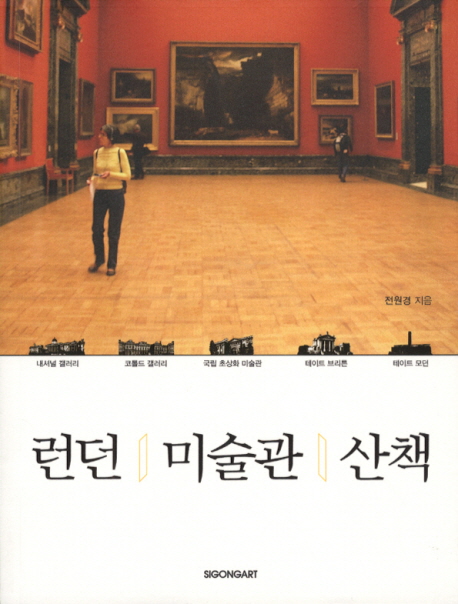2019. 7. 20. 21:14ㆍ美學 이야기
코톨드 갤러리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 하나는 이 작은 갤러리에서 고갱과 고흐의 그림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폴 고갱과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이 두 화가는 188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를에서 짧은 동거 생활을 했다. 고흐는 화가들끼리 모여 함께 작업하고 토론하는 ‘남쪽 작업실에서의 생활’을 꿈꾸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남프랑스의 아를에 내려와 작업실 겸 살림집인 ‘노란 집’을 세냈다. 그리고 파리에 머물던 고갱이 고흐의 초대에 응해 1888년 10월 아를로 내려왔다.
친하게 지냈던 인상파 화가들은 작풍도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마네와 드가, 그리고 모네와 르누아르는 일생 동안 친하게 지냈고, 이들의 작품 경향은 서로 엇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를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고갱과 고흐는 화풍도 성격도 극단적으로 달랐다.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은 이내 불화와 긴장으로 점철되었고 결국 동거 두 달 만인 1888년 12월,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는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만다. 고갱과 함께 살던 당시, 고흐는 유명한 〈해바라기〉를 그렸다. 고갱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의 모습을 다시 그림으로 그렸다. 그런데 고갱이 그린 자신의 초상을 본 고흐는 “이건 분명 나군. 그런데 미쳐 있는 나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코톨드 갤러리의 대표작인 고흐의 〈귀를 자른 자화상〉은 고흐가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후 처음으로 붓을 잡고 그린 작품이다. 1888년 12월 23일, 고갱과 고흐는 격렬한 다툼을 벌였다. 흥분한 고흐는 면도날을 들어 고갱의 목에 댔다. 고갱은 고흐의 눈에서 번득이는 광기를 읽었고, 도망치듯 집을 나와 그날 밤 돌아가지 않았다. 혼자 남은 고흐는 면도날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자른 후, 쏟아지는 피를 대강 붕대로 막고 자른 귀를 신문지에 싸서 집을 나섰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던 창녀에게 신문지 뭉치를 전해 주고 집으로 돌아와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 고갱은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고흐의 동생 테오에게 연락한 후, 바로 기차를 타고 아를을 떠나 버렸다. 그 후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최근 독일사학자들 사이에서 고갱이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고흐의 귀를 자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미술사가들은 이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일축했다).
생 레미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고흐는 한동안 발작 상태에 있다가 1889년 1월 중순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다. 한때 과다출혈로 생사를 넘나들었던 귀의 상처도 어지간히 회복된 후였다. 몸이 회복되자마자 그는 붓을 들고 자신의 모습, 귀를 붕대로 감싼 모습을 그렸다. 그 결과물이 이 〈귀를 자른 자화상〉이다.
그렇다면 왜 고갱과 고흐는 이렇게 ‘피를 보는’ 격렬한 싸움을 벌여야만 했던 것일까? 그것은 두 화가 간의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 고흐는 빛과 자연 풍경을 보며 그림에 대한 영감을 얻는 스타일이었다. 특히 아를에 오면서 햇빛에 대한 그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그가 아를에 머물던 1888년에 그린 그림들만 봐도 그렇다. 〈밤의 카페〉나 〈별이 빛나는 밤〉, 〈씨 뿌리는 사람〉, 〈노란 집〉 등은 모두가 빛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얻은 결과물이다. 그는 원색 중에서도 햇빛의 색깔과 가장 가까운 노란색 물감을 임파스토(impasto, 유화 물감을 두텁게 바르는 기법)로 캔버스 가득 칠하곤 했다(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물감을 살 돈마저 없어’라는 호소가 자주 등장한다. 고흐의 그림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물감을 사용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설이나 원시 부족, 상상 속의 세계에 매료되어 있었던 고갱은 자연 풍경을 통해 그림의 모티프를 얻는 것은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고흐를 비난했다.
예술가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견해차였지만 문제는 두 사람의 성격에 있었다. 고흐는 격렬한 데다 쉽사리 흥분하는 광기 어린 성격이었고, 고갱은 또 고갱대로 오만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는 스타일이었다. 극단적인 두 성격의 대립, 그리고 점차 고조된 갈등은 마침내 고흐의 발작과 끔찍한 자해로 이어졌던 것이다.
고갱과의 결별 후 처음으로 그린 이 자화상에서 고흐는 한때 고갱으로 인해 흔들렸던 자신의 스타일을 다시금 찾은 모습이다. 그림 속에서 고흐는 창으로 들어오는 환한 겨울 햇살 속에 서 있다. 연둣빛 벽, 그가 입은 초록색 코트, 그리고 파란색 모자 등은 하나같이 선명한 색채로 칠해져 있다. 형태는 강렬하면서도 단순하다. 화가의 왼편에는 비어 있는 캔버스가 서 있고, 오른편에는 일본의 우키요에(浮世繪)가 걸려 있다.
고흐는 말 그대로 ‘그림에 중독된’ 화가였다. 그는 10년에 채 못 미치는 화가 생활 동안 2천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 이 자화상에서 고흐는 몸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금 그림을 그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화가의 뒤편에 서 있는, 텅 비어 있는 캔버스는 숨길 수 없는 그의 공포를 여실히 보여 준다. 그것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근원적인 공포감이다. 자세히 보면 빈 캔버스에는 무언가 그리다 만 형체가 뭉개져 있다. 화가는 자신의 운명, 결국 그 공포에 무릎 꿇게 될 운명을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그림을 그린 지 1년 반 후인 1890년 7월, 고흐는 서른일곱의 나이에 피스톨로 가슴을 쏘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코톨드 갤러리의 〈귀를 자른 자화상〉 앞에는 늘 서너 명의 관객들이 서서 고흐의 표정을 홀린 듯 응시하고 있다. 고흐의 그림은 임파스토 기법 때문에 물감 냄새가 금방이라도 번져 올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극단적인 가난, 귀를 자른 광기, 그리고 희망 없는 앞날. 그림 속의 비쩍 마른 남자는 이 모든 숙명에 결연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패배가 예견된 싸움이다. 마치 트로이 전쟁에 나서는 헥토르처럼 말이다.
고흐는 죽기 두 달 전인 1890년 5월부터 7월까지 매일 한 점씩, 70점 이상의 그림을 쉬지 않고 쏟아 냈다. 그림에 대한 그의 광적인 집착은 살고 싶다는, 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절규 아니었을까. 그러나 고흐를 사로잡은 광기는 그 자신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스톨을 흔들며 보리밭으로 걸어가던 고흐는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중얼댔다고 한다. 그를 사로잡은 예술혼은 그를 불세출의 화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한 인간 고흐를 철저히 파멸시키고 말았다.
귀를 붕대로 싸맨 고흐의 자화상에서는 고흐라는 한 남자를 찢어발긴 모든 것들, 광기와 열정, 분열된 의식, 운명에 대한 덧없는 항거 등이 어지럽게 교차한다. 그림을 가득 채운 환한 색채 속에서 나는 숙명과의 싸움에서 결국 패배하고 만, 이 위대하고도 불행한 화가의 소리 없는 절규를 듣는다.
'美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원시로의 회귀를 주장한 회화계의 이단아 폴 고갱 Paul Gauguin (0) | 2019.07.22 |
|---|---|
| 틴토레토 〈자화상〉 / 루브르 박물관에서 꼭 봐야 할 그림 (0) | 2019.07.20 |
| 화훼도- 화훼화 (0) | 2019.03.27 |
| 조선후기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의 영모화(翎毛畵) ‘닭’ (0) | 2019.03.21 |
| 민화 이야기 外 (0) | 2019.03.21 |